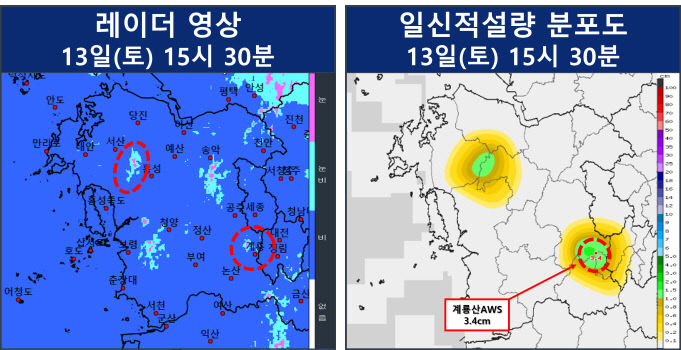|
| 이대희 위원장 |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전쟁과 군비 경쟁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름을 가장 크게 내걸고, 대포와 원리가 같은 불꽃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시민 축제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도 되는가. 이 장면을 정말 "야구팀의 선전을 축하하는 축포"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방산 기업을 홍보하는 축포"이기도 한가. 따져 묻지 않을 이유는 없다.
불꽃은 폭발을 숨기지 않는다. 대신 폭발을 '구경거리'로 만든다. 사람들은 굉음과 섬광을 음악과 함께 즐기고, 마지막 최대 장면에서 터지는 연속 폭발에 맞춰 환호한다. 원래 폭발이라는 말은 파괴와 죽음, 전쟁을 떠올리게 하지만, 불꽃축제 속에서 폭발은 "감동적인 피날레", "화려한 연출"의 다른 말이 된다. 폭발과 폭력이 이어져 있다는 감각은 조금씩 무뎌진다.
이때 방산 기업은 무엇을 얻을까. 불꽃은 폭발의 무서운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기업은 그 자리에 로고와 브랜드를 끼워 넣는다. 시민의 기억 속에서 "한화"라는 이름은 무기와 포성이 아니라, 야구팀과 불꽃, 축제와 더 쉽게 연결된다. 무기와 폭발은 더 이상 불편한 단어가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 효자', '국가 경쟁력' 같은 말로 포장된다. 불꽃축제는 무기산업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매우 효율적인 홍보 방식이다.
이 과정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도시가 방산 기업 이름을 전면에 내건 불꽃축제를 반복할수록, 시민들은 "이 기업이 잘 돼야 지역경제가 산다", "방산 클러스터가 대전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입받는다. 전쟁과 군비를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정치·사회적 쟁점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의 언어로만 이야기된다. 이런 인식이 굳어질수록,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 방향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대전은 이미 방산·무기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다. 방위사업청 이전 논의, 국방·우주·무기 관련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 방산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삼자는 구상도 계속 등장해 왔다. 여기에 시민 축제까지 방산 기업의 이름과 결합하면, 대전은 점점 더 스스로를 "방산의 도시"로 규정하게 된다. 프로야구단의 선전, 그룹의 기념일, 방산 기업의 브랜드, 하늘로 쏘아 올린 폭발이 한 화면에 겹쳐질수록, 이 도시는 어떤 산업을,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자신을 설명하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불꽃놀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밤하늘을 함께 올려다보는 경험과 기억을 가벼이 취급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질문은 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축하하며, 어떤 산업의 이미지를 함께 띄워 올리고 있는가. 전쟁 무기를 만들어 파는 기업이 세계 군비 경쟁에서 얻는 이익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민의 축제와 감동의 언어까지 함께 가져가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넘겨도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불꽃은 잠깐 하늘을 밝히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불꽃 위에 어떤 로고를 얹었는지, 그 순간 어떤 산업과 이익을 함께 미화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이번 한화이글스 불꽃축제는 단지 한 야구팀의 성적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 도시에 사는 우리가 무기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축하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 되묻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대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117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78_20251214010012236000523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