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생일도 한몫한다. 지금은 영면에 드셨지만, 어머니와 나는 생일이 3일 간격 이어서 일가친척도 내 생일을 기억했다. 다만 지금은 선물을 주고받던 예전과 달리 형제조차도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이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어머니 생신 때 오면서 내 선물도 꼭 챙겨왔다. 그저 말만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혼났으니까.
친구들과 생일도 잊지 않는다. 40대 무렵, 어찌된 건 지 친구들은 결혼이 늦었다. 지금은 다들 결혼했지만, 그 당시는 싱글이다 보니까 군것질 거리를 준비해서 작은 파티를 열곤 했다. 수다를 위한 파티.
생일을 핑계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서로 바쁘기 때문에 안부 전화조차도 잊곤 하는데 말이다. 그렇더라도 12월만 되면 그 당시 추억담을 빼놓지 않는 것을 보면 그때가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그 당시 <클래식음악감상회>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싱글들의 모임이 활성화되었던 것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개개인이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지닌 대부분 직장인의 미혼 남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클래식 음악 감상은 매주 1회 모임이었지만, 그 외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 삼삼오오 모였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계룡산 산행하자고. 그즈음은 산행을 즐기던 때여서 아이젠만 급히 챙겨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벌써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동학사에 도착하자 눈은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우리는 연신 환호성을 지르며 남매탑을 향해 올라갔다. 삼불봉 정상에 서서 설경을 보며 또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이튿날은 다들 목이 쉬었다. 그렇게 추억을 쌓으며 신바람이 났었다.
일행 중 마호병에 준비해 온 뜨거운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실 때의 풍부해지는 느낌도 잊히지 않는다. 12월은 그렇듯 추억의 산실이 되었다. 글을 쓰는 것도 그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중한 내 일상을 기억 속에 저장해놓고, 뭔가를 쓰고 싶을 때 기억을 상기해서 쓰니까 말이다.
지금은 독서를 즐기며 글쓰기를 좋아한다. 가끔은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도 내게 소중한 글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본래 글을 쓰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맘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서랍을 정리하듯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글벗에게서 받은 '열쇠고리' 선물이 즐겁다. 오래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닐 때 나도 들른 적이 있어선지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향수에 젖게 된다. 답례로 벗에게 시를 한 편 썼다. 이 시를 읊조리며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시제: <튀뤼멜바흐 폭포>
여행 갔다가 온 친구가 선물
열쇠고리를 내민다
금빛 하트모양
뚜껑을 열자 폭포 사진이다
쏙 들어가면 동굴로 통할 것 같은
튀뤼멜바흐(Tr?mmelbach) 폭포는 동굴 속에 있다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두컴컴한 통로
계곡 앞에서 내리자 거대한 폭포수
포효하듯 새하얀 거품을 뿜어낸다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계곡마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치는 튀뤼멜바흐폭포
태초에 신비가 숨어있는
오래전 스위스 여행의 기억들이 친구의 손에서
내게로 왔다
 |
| 민순혜/수필가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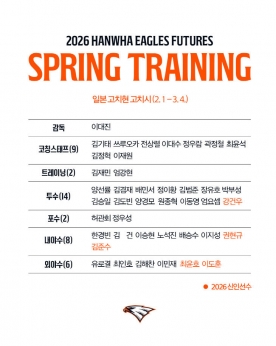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29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