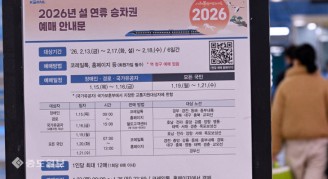|
여민관은 대통령집무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하는 비서동이다. 여민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이곳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증·개축된 이래 정권 교체 때마다 간판을 바꿔 달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위민관(爲民館)으로 이름이 바꿨다. 위민은 백성을 위한다는 뜻이다.
위민관은 박근혜 정부 때도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도로 여민관이 됐다.
여민이나 위민이나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짐으로 해석된다. 큰 틀에서 의미가 달라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도 진보 정권은 여민관, 보수 정권은 위민관을 각각 고집한 셈이다. 왜 그랬을까.
집권 때 전(前) 정부 흔적을 지우려 했던 일각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비서동 간판도 매번 바뀐 것 아닐까.
대부분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부르든 관심이 없을 것 같다. 정치보단 먹고사는 데 온 신경을 쏟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잘 챙겨주길 바랄 뿐이다.
최근 충청권에선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대전 충남 통합 지자체 명칭을 둘러싸고 일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통합 지자체를 대전충남특별시라 명명했다. 2024년 말 대전 충남 통합을 선언한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다르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충청권 의원 오찬 뒤 충남대전특별시로 붙이자는 말이 돌고 있다. 충남이 대전의 뿌리라는 이유에서 이같이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 보수 야당이 먼저 대전충남특별시라 하자 여당이 충남대전특별시로 순서를 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마치 정권의 부침에 따라 위민관, 여민관 간판이 수차례 바뀐 것을 연상케 한다.
명칭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존 두 가지 안(案)의 약칭이 '대충시' '충대시'로 좋지 않자 여권 일각에서 (가칭)충청특별시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를 두고 국힘은 '대전' 지우기가 아니냐며 민주당을 맹폭했고 여당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공세라 일갈했다.
민주당은 결국 두 지역 명을 모두 사용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대전 충남 통합추진 과정에서부터 여야 기 싸움이 점입가경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데는 양쪽 모두 뒷짐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이 의제를 놓고 양당이 제대로 된 마주 앉은 적이 없다. 이쯤 되면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 협치는 실종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대전 충남 통합은 수도권 집중 중병이 걸린 대한민국 호(號)를 정상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우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대전 충남 통합 지자체로 가져와야 한다.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 구성을 법안에 명문화해 범정부적인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출범 목표를 맞추려면 물리적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늦어도 2월 국회에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일분일초라도 대립각을 세울 시간이 있는지 여야에 묻고 싶다.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천재일우 기회를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강제일 정치행정부장(부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 동구 소프트테니스팀, 전국 최대 강팀으로 `우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14d/20260107010004431000178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