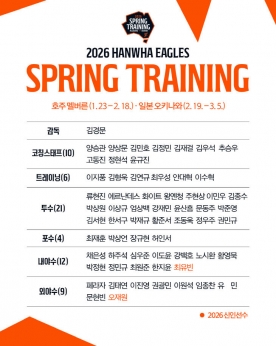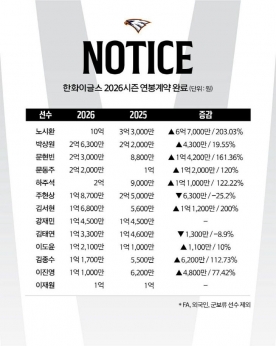|
| 송기한 대전대 교수 |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시의 현대성을 확보한 시인이다. 가령, '카페 프란스'라는 제목으로 루바쉬카(러시아풍의 셔츠)라든가 페이브먼트(도로) 등의 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가 전통적인 시조나 민요와 구분시킨,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초기의 작가들이 예술의 현대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래어를 도입하는 수법을 엑조티시즘(exoticism)이라고 지칭됐다.
지금 대전 시내에는 트램(tram) 공사가 한창이다. 그에 따른 교통 불편은 덤으로 따라오고 있다. 이것이 대전 지하철 2호선 트램이란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는 2호선 공사가 끝나고 지상의 노면을 모두 덮었다고, 그래서 깨끗하고 넓은 예전 도로의 모습대로 회복됐다고 한다. 그리고 대전보다 약간 큰,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에도 3개 노선의 지하철이 건설돼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처음 트램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차가 아니냐고?", "전차를 21세기 현대화된 도시에 왜 설치하느냐?", "교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이미 철거된 운명을 맞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랬더니 옆에 앉은 분이 바로 답을 줬다. "유럽은 트램이 대세래요"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 말에 대한 적절한 응대가 떠오르지 않았다. 유럽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중국, 일본, 미국을 닮고자 하더니 이제 그 모방의 대상이 유럽인가.
이런 의문이 있던 차에 지난 여름 서유럽과 동유럽을 15일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이곳의 교통 체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유럽에 많은 트램이 운행했고, 또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트램이 유럽에 필요불가결한 교통수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트램들은 근대 초기에 건설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유럽 도시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일이다. 유럽은 중세 시대의 건축 문화재가 많고,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한계를 보족하기 위해서 이미 건설된 트램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램은 그저 전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차라고 하면 구시대적인 느낌을 주고, 트램이라고 하면 21세기 최첨단의 교통수단이 되는 것인가. 언어 사대주의는 우리를, 사회를 미혹시켜 왔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초 최첨단의 시를 쓴 이상이 '제비다방'을 창업했지만 실패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대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상호를 '버드 카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랑하는 기생 금홍이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언어 사대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통신 혁명으로 불리던 이동통신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동통신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몸에 지니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대중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지는 이를 경험한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휴대전화를 개발한 기업은 삼성과 엘지였다. 삼성은 휴대폰의 이름을 애니콜(anycall)이라고 했고, 엘지는 화통(話通)이라고 했다. 의미는 동일하나 대중에게 호소하는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받아들여졌다. 언어 사대주의에서 밀린 엘지 휴대폰의 운명은 이미 탄생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 트램이 전차임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만약 트램이라면 정차역 주변의 부동산값은 벌써 불기둥을 이뤘을 것이다. 그런데 고드름처럼 차갑게 그저 매달려 있지 않은가. /송기한 대전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새해설계] 김동수 유성구의장 “생활의 불편부터 줄이는 책임 의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5d/78_2026012501001898000079681.jpg)

![[주말날씨] 충청권 강추위 계속… 때때로 눈비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4d/78_2026012301001844500075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