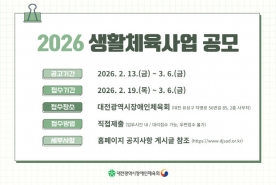|
| 당진의 여름 김치라고 할 수 있는 '꺼먹지'를 활용하면 꺼먹지 비빔밥, 꺼먹지 깻묵장, 꺼먹지 볶음, 꺼먹지 보쌈, 꺼먹지 전, 꺼먹지 김밥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꺼먹지'는 11월 김장철에 무 잎을 항아리에 소금과 고추씨를 넣어 절인 후 이듬해 5월부터 꺼내 먹는 당진의 여름 김치다.
'꺼먹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뫼 성지 방문 당시 사제단 만찬 및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자들의 식사 메뉴로 제공되면서 부터다.
무청(蕪菁)이 문헌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중국의 『시경(詩經)』 [패(?) 곡풍(谷風)]이다.
이 책의 주(註)에, "이 두 가지 채소는 만청(蔓菁, 순무)과 복(?무)의 부류인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맛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므로 뿌리가 맛이 나쁘다고 잎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문헌인 『고려사(高麗史)』 8권 [문종세가(文宗世家) 11년조] 에 '임금이 말하기를, 무청을 캘 적에 아랫부분의 맛이 안 좋다고 버리지 말라〔采?采菲 無以下體〕고 하였는데,' 아마 당시 무 보다 무의 잎을 더 소중히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무청(蕪菁)은 무와 잎을 통칭하는 것이며, 무의 잎을 청엽(菁葉)이라고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청장관(靑莊館)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菁葉禦冬懸敗壁(청엽어동현패벽)겨울을 지내려 무 잎을 헌 벽에 매달고"라고 나온다. 무 잎으로 시래기를 만드는 모습을 시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시래기를 '축소(蓄蔬)'라고 했다.
조선전기 명신이며 학자인 성현(成俔 1439~1504) '秋雨歎(추우탄)가을비에 탄식하다'에 '시래기'가 등장한다. '蓄蔬猶可活妻拏(축소유가활처나) 모아 둔 시래기로 처자식은 겨우 먹여 살린다지만, 鞭?何堪催賦稅(편복하감최부세) 세금 내라 매질하며 독촉하니 어찌 견뎌내리오.'
조선 중기 문인인 택당 이식의 『택당집(澤堂集)』에서도 '去年禾未登(거년화미등)지난해엔 곡식을 거두지 못했어도 蓄蔬代粳稻(축소대갱도) 그래도 시래기로 밥을 대신하였는데 今年蔬也無(금년소야무) 올해는 그나마 그것마저 전혀 없이 ?室淨如掃(경실정여부) 온 집안이 비로 쓴 듯 깨끗이 비어 있네'라고 적고 있다.
이 시는 택당이 가을 가뭄으로 뿔뿔이 흩어져 걸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쓴 시다.
이 두 시(詩)를 보면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는 시래기를 한자로 '蓄蔬(축소)'로 썼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 조선 말기 사옹원 분원공소의 공인(貢人)이었던 지규식은 1851~1911년 이후까지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에서 시래기를 '진청엽(陳菁葉)'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기록해 놨다. '진청엽'은 무 잎을 말리는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로 재미있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시래기의 어원은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일까?
조선 후기의 학자 이가환, 재위 부자가 1802년에 사물의 이름을 한자와 우리말로 함께 기록한 어휘집 『물보(物譜)』에는 한문으로 '棲菹(서저)'라 쓰고 우리말로 '시락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시락이'가 음운변화를 거쳐 '시라기'→'시래기'가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시래기'에 대해 1897년 미국 선교사 제임스 스콧 게일 목사는 그가 편찬한 『한영자전(韓英字典)』에서 '시래기를 고채(枯菜) 즉 마른 나물로 풀어쓰고 국물(soup)에 사용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어 사전에는 시래기를 '채간(菜干)'이라 하였는데 이 뜻은 '채소 말랭이, 말린 채소'로 우리의 배추 잎이나 무 잎을 말린 '시래기'와는 의미가 다르다.
일본어에는 '히바(ひば乾葉)'라 하여 한국 시래기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에는 '프리아리엘리(Friarielli)'라고 하는 무청 시래기가 있다. 살시차 에 프리아리엘리(Salsiccia e Friarelli)라는 피자에 이 시래기가 듬뿍 올라가 있다.
고문헌을 보거나 근대 자료에 '시래기'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청(蕪菁) 자체를 지(漬)로 한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무청저즙(蕪菁?汁)이 조선 인조 17년(1639)에,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瘟方)』을 합본하여 간행한 『구황촬요벽온방(救荒撮要?瘟方)』에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무청저즙은 무의 잎 즉 청엽(菁葉)으로 담근 김치가 아니고 순무로 담은 나박김치를 말한다.
옛날에 동치미 담글 때 동치미 무와 여린 잎을 같이 넣어 담그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잘 담근 동치미의 청엽(菁葉)은 실파와 청각이 어우러져 아삭하니 시원한 맛이 있다.
그 외 무 잎을 말려 시래기로 하거나 버릴지언정 김치를 담그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다.
그래서 당진의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꺼먹지'는 향토음식 사료(史料)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
 |
| 당진의 농가맛집 '아미여울'의 '꺼먹지 맥적' 한상 차림. |
당진시 송산면 일대는 간척공사를 통해 방조제가 만들어져 농경지를 형성하기 전 까지는 천일염전이 대부분으로 소금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당진의 무, 배추 생산은 충남도에서 으뜸일 정도이며, 수도권 지역으로 출하될 정도이다.
특히 봄 무와 가을 김장무가 유명한 당진은 상대적으로 먹을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엽과 무를 염장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꺼먹지'와 '짠지'라는 독특한 당진만의 토속음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꺼먹지는 청엽을 소금에 아주 짜게 절이면 검은 빛을 띠게 된다. 그래서 '꺼먹지'란 이름이 붙었다. 짜게 절여 진 청엽을 물에 며칠 담가 놓았다가 삶아서 볶거나 무쳐 먹는다.
 |
| 당진시 순성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개업한 농가맛집 '아미여울' |
그러니 "사장님 계십니까?"하면 이 곳에 일하는 누가 됐든 "전 대요"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집이다. 마침 순성면과 인접한 예산 고덕이 고향인 충남도민회중앙회 이명범 회장이 고향에 잠시 내려 왔다 하여 점심을 '꺼먹지맥적'으로 함께 했다.
보통 시래기나물은 잘못 삶아 나물로 하면 질기거나 퍽퍽한 느낌을 주는데, 꺼먹지는 씹히는 식감이 부드럽고 씹을 때 마다 오히려 감미가 돈다.
이렇듯 '꺼먹지'는 청엽을 그늘에 말린 후 겨울부터 삶아서 먹는 시래기와는 가공 방법이 다르다.
'꺼먹지'는 싱싱하고 푸른 청엽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소금을 뿌려 오래 동안 항아리에 넣어 놓아서 그런지 식감이 매우 부드럽다.
'꺼먹지' 담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1월 말경 무청(蕪菁)의 잎(菁葉) 열 줄기 당 소금 500g과 고추씨 한 컵을 골고루 섞이게 항아리에 넣고 소주 400㎖를 넣어 절인다. 이듬해 5월부터 꺼내 먹는데, 절여진 '꺼먹지'를 그대로 먹기에는 너무 짜다. 물에 담가 짠 맛을 줄인 다음 요리를 하는데, '꺼먹지'를 활용하여 해 먹는 음식은 다양하다. 꺼먹지 비빔밥, 꺼먹지 깻묵장, 꺼먹지 볶음, 꺼먹지 보쌈, 꺼먹지 전, 꺼먹지 김밥 등이 있다.
김영복/식생활문화연구가
 |
| 김영복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아울렛, 봄 맞이 마케팅으로 분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6d/78_2026022601001958300084671.jpg)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8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