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용태 포스텍 교수 |
연구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친환경소재대학원 김용태 교수, 정상문 박사 연구팀, 서울대 신소재공학과 손준우 교수,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영광 박사 연구팀이 수행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하다. 맑은 날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흐린 날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불규칙성을 해결할 열쇠가 바로 '수소'다.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 수소를 만들기는 쉬운데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느리고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가 필수다. 요리할 때 센 불로 빨리 끓이는 것처럼, 촉매가 있어야 물 분해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연구팀이 연구에서 주목한 소재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이 물질은 구조가 안정하고 성분 조절이 쉬워 촉매로 주목받지만 입자의 크기가 100nm 이상으로 커 반응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의 핵심 아이디어는 엑솔루션 현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내부에 숨어있던 금속 이온들이 표면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현상이다. 기존에는 이 과정에 800℃ 이상의 고온과 수 시간의 열처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비드 밀링이라는 공정을 이용해 300℃의 저온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비드 밀링은 작은 구슬(비드)과 함께 물질을 회전시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기술이다. 세탁기에서 빨래와 세탁볼이 부딪히며 때를 빼내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입자를 50nm 이하로 잘게 부수면서 결정 구조를 느슨하게 만든다. 그러면 내부 금속들이 표면으로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촉매는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촉매보다 산소 발생 반응 활성을 약 6배 높였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 온도를 300℃로 낮춰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연구는 고성능·저비용 수전해 촉매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나노 수준에서의 정밀한 구조 제어 기술이 수전해 시스템 효율 향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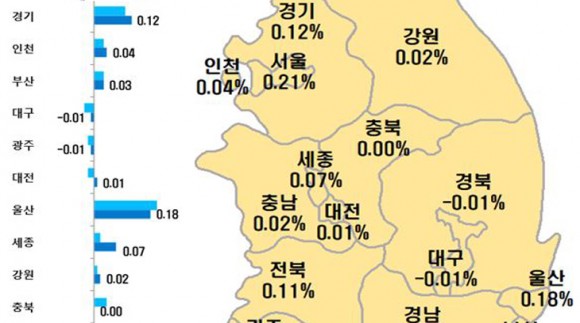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7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7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중도일보와 함께하는 2026 정시가이드] `국립한밭대` 지산학연일체 혁신 플랫폼 대학… 기본이 강한 리더 키운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78_2025122601001498000063051.jpg)

![[2025년 결산] 중구, 생활행정 성과를 쌓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78_20251225010022390000980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