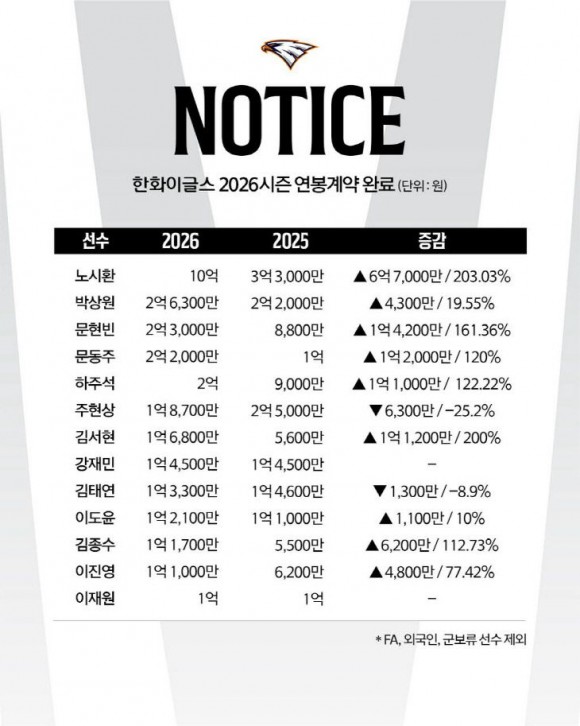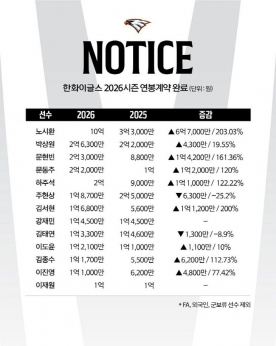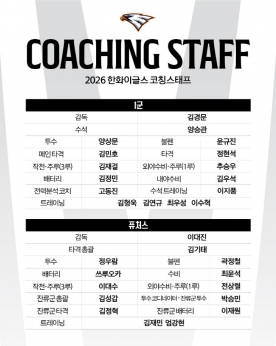|
| 정바름 기자 |
환갑을 앞둔 아버지는 묻는 말마다 툴툴거리는 딸한테 내심 서운하셨나보다. 앱으로 택시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의 '디지털 문맹'이었던 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첨단 IT 시대(?)에 살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셨다. 도와주던 후배들도 옆에 없으니 요즘 컴퓨터를 붙들고 한참을 씨름 하신다. 종이와 펜이 익숙한 세대는 PC과 모바일을 다루는 것도 참 버겁다.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나마 잘 아는 딸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조작법을 물어보면 "이것도 할 줄 모르냐"며 화만 낸다. 거듭 물어보기 눈치 보이는 걸 AI는 끊임없이 질문해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해주니 좋다는 것이다. 외동딸 하나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반려견뿐이었는데, 또 하나가 생겼다.
친구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마다 ChatGPT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했다. 위로와 공감에 해결방안까지 적절하게 제시해줘서 좋단다. 주변에 털어놓으면 괜한 참견에, 훈계를 들을만한 고민도 ChatGPT는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에 비용이나 시선이 부담스러운 이들도 상담과 조언을 구할 때 ChatGPT를 이용한다고 했다. 사회에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AI가 보듬어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AI는 자아가 없다. 희로애락을 느끼지 못하니 남의 일에 공감하지도 못한다. 그저 입력된 값대로 인간처럼 감정을 느낀다는 듯 꾸며서 답할 뿐이다. 이용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왜 AI에게 상담을 받고, 주변인들에게 꺼내지도 못할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걸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싸늘한 사회에서 들을 수 없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
AI 시대가 가장 무서운 점은 인간이 인간을 찾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다. 속앓이하다가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과 대화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싫은 거다. AI는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니 너무 고마운 존재다. 그렇다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미움받기 싫으면 기자 일하면 안 돼' 입사 초,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신입 기자에게 선배는 이렇게 당부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며 내린 결론은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처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단 것이다.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냉정한 태도보단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족한테는 따스한 말하는 게 어렵다. 왜일까.
/정바름 사회과학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