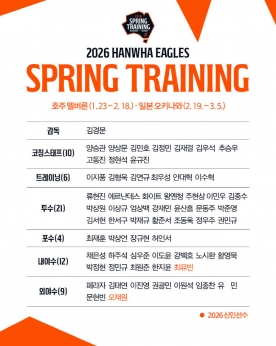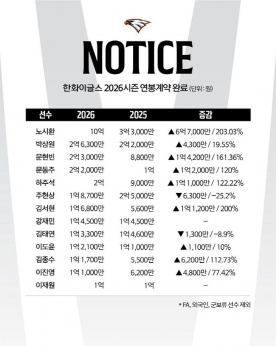|
| 김정식 기자 |
3월 지리산 산불로 시천면과 삼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7월에는 산청군 11개 면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다시 선포됐다.
군 전체가 한 해에 두 번이나 국가가 인정한 재난지역이 된 것이다.
행정도, 군민도, 누구도 쉽게 버티기 어려운 해였다.
재난의 깊이는 숫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산청군은 올해 예비비 330억 원을 수해 복구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고 매칭에 따라 334억 원 군비 부담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산청군 재정이 벼랑 끝에 섰다는 사실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진짜 힘들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더 선명해진다.
그 어떤 해보다 군민 삶이 무너진 해였다면, 그 어떤 해보다 생계를 지탱할 안전망이 필요했던 해였다면, 농어민 기본소득은 그때야말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였다.
재난은 잠깐의 피해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그 붕괴를 막아줄 작은 버팀목이었다.
그럼에도 산청군은 이 중요한 시점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거창과 함양이 "군민을 위해 일단 도전은 해야 한다"고 나섰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산청군은 기회를 따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회 앞에서 스스로 물러섰다.
그리고 군민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산청군 담당자는 "예산이 너무 어려워 도전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은 사실이다.
예산이 부족했고, 내년 부담도 막대했다.
행정이 겪은 고충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군민 삶은 예산 논리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군민은 서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벌어 내일을 버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군민들은 되묻는다.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본소득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우리 삶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 왜 가장 절실한 정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나."
여기에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산청군 공무원 대다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한다는 현실이다.
군민과 행정이 같은 삶의 조건에 있지 않다.
그 거리감이 이번 결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주에서 출근하고 진주로 돌아가는 공무원에게 농어민 기본소득은 "예산이 부담스러운 정책"일 뿐이다.
그러나 산청에서 살아가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은 "재난 속에서도 내일을 버티게 해주는 숨구멍"이었다.
당사자 성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산청군 청렴도가 높은 이유 역시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석된다.
공무원과 군민 사이에 갈등할 만한 접점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출근과 퇴근 사이에만 머무는 행정이 정작 군민 삶과 고통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구조.
이번 결정은 그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뼈아프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산청군 행정에게 이번 사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산청군민에게 이 정책은 재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절호의 기회였다.
행정이 계산한 숫자는 이해되지만, 군민이 느낀 상실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결정'만큼은 군민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어도 "군민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처럼 허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청군은 재난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군민이 잃은 것은 재난보다 더 아프고,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였다.
군민 곁에서 싸워야 할 순간에 군민을 대신하지 않았다는 상실감.
그 상처는 앞으로도 산청군민 마음에 깊게 남아 있을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