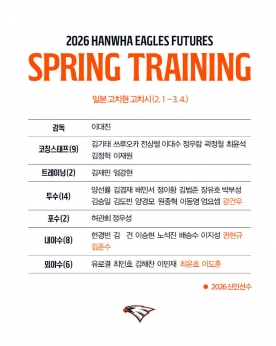|
| 황미란 지방부장 |
80년대 초등학교 교실은 지금보다 훨씬 솔직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의 입은 생각보다 빠르고 가벼웠다. 그날의 사건은 사회시간에 일어났다. 대가족과 핵가족을 배우던 중, 선생님이 물으셨다. "우리 반에 누가 형제가 가장 많지?" 누군가 옆집 ○○이를 가리켰다. "쟤네는 9남매래요." 순간 교실이 술렁였다. 아들 하나에 딸 여덟이라는 말이 이어졌고, 나는 괜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언니 셋은 같은 공장 다닌대요." 사실이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그 말을 내뱉은 데에는 부러움이 컸다. 3남매의 맏이였던 나는, 철마다 언니들이 챙겨주는 새 옷을 입고 학용품을 쓰는 그 친구가 꽤나 부러웠다. 그래서 칭찬 비슷한 마음으로, 괜히 아는 체를 한 셈이었다.
훗날 중학생이 되어 그 친구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당시 9남매라는 사실도 부끄러웠는데, 언니 셋이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교실 안에 퍼져버린 게 너무 싫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보다 더 속상했던 건, 그 이야기가 그 친구 부모님에게는 평생의 한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제서야 알았다.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입밖으로 나간 사실은 누군가의 평가가 되고, 오랜시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문제는 어른이 된 지금, 그 '사실의 발설'이 때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온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던 시대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법의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건이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외면한 부모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적 분노와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형법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은 쉽지 않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뿐 아니라 미투 운동, 학교폭력 고발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말이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해외의 사례는 다르다. 많은 나라가 명예훼손 문제를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루고, 그마저도 허위사실에 한정한다. 영국은 2010년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독일과 일본 역시 사실이 진실이거나 공익적 발언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분 면책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반복적으로 법 개정을 권고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무슨 명예훼손인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도 이런 오랜 논쟁의 연장선이다.
물론 폐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병역 문제나 성적 지향, 가정사 같은 민감한 개인사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1년 "한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돌이켜보면 그날 내가 했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도, 온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언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는 그 사실의 공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법으로 묻고 있다. 말해야 할 사실과 말하지 말아야 할 사실의 경계는, 지금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방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황미란 기자
황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