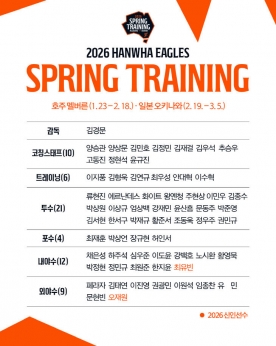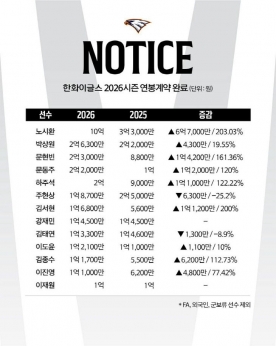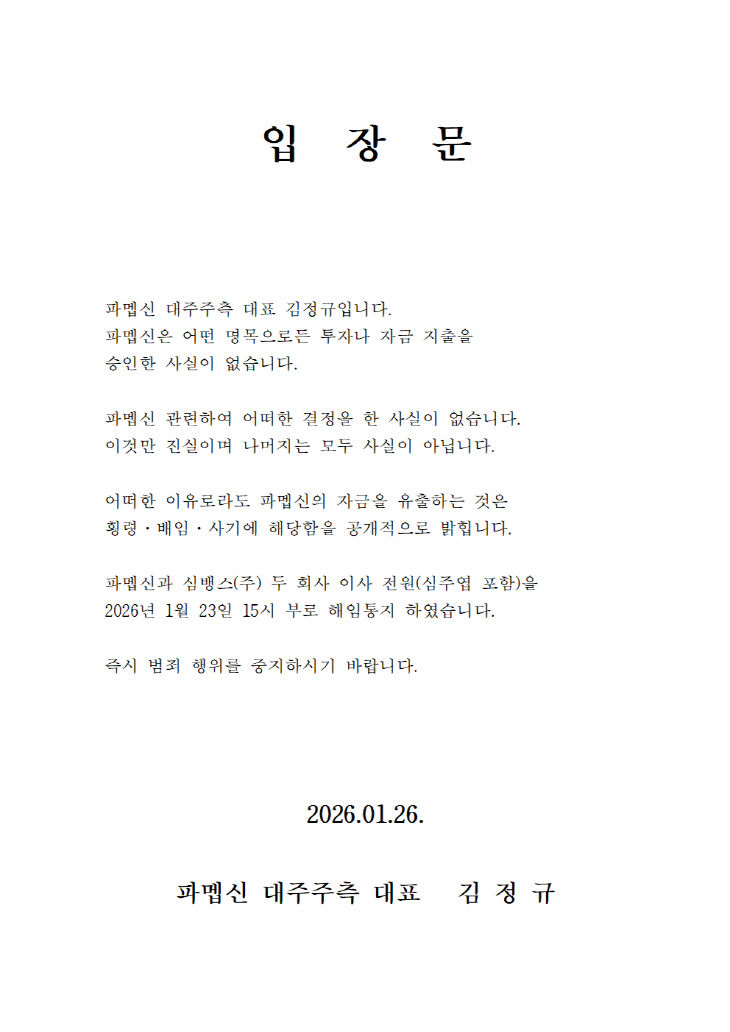|
| 김병윤 대전대 명예교수 건축가 |
이전의 건축 설계 작업은 어떠했을까? 모두 한데 모여 설계도를 만드는 크고 작은 작업실에서 건축설계는 이루어 졌고, 엘리트들의 일사불란한 작업 사무실은 마치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의 생산 현장을 떠 올리게도 했다. 80년대 초만 해도 외국 선진건축학교의 컴퓨터 설계 수업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시험적 시기였으나 본격적으로 90년대가 되며 그 분위기를 컴퓨터가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두 모니터 앞에서 지우개질 대신 키보드를 누르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회의하는 시간 외에는 모니터를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 매러 웨어 유아'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부흥이 오면서 변화된 축제처럼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이를 함께 공동작업으로 진화시킨 시기가 초반에 있었다. 시차가 다른 나라의 건축인들이 이를 아주 반겼고 낮과 밤이 다른 것이 오히려 공동작업에 기회를 주었다. 내가 작업하고 잠들면 지구 반대편 나라의 동료가 깨어나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참으로 환상적인 공동 연출이었기에 모두 이 상황을 획기적인 협연으로 여겼던 것이다. 당시 이 공동의 작업은 상대의 작업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했지만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터득 해가는 매우 지혜로운 학습 방식의 작업이었다. 이 모두가 컴퓨터의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나름 진화가 아니었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잔치는 끝나 건축디자인이 지닌 독자적인 개성과 작가의 개별적 사고의 집합체로서 완성되는 건축의 고유한 특성 사고가 부풀어지면서 이 공동의 작업은 슬며시 사라진다. 국제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잘 알려진 건축가가 동원되는 사업인 경우 공공과제가 아니어도 건축 발주처의 성향에 따라 컨소시엄 방식이 자주 등장하지만 여전히 함께하는 공동작업방식이 아닌 과정의 상호개입만으로 이루어 진다. 아쉽게도 독립적인 작업방식의 업벽(業癖)이 큰 것이다.
건축 현상공모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과정은 불편하고 결과는 많은 불만이 따른다. 최소한 다르게 진화시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건축의 과제는 초기에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논의하던 시간을 상기하며 작업을 함께 하는 공동의 과제로 전환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 이제 건축은 독자성을 논하고 작품의 경향을 중시하면서도 한편 시대를 넘는 특히나 공공건축의 설계 과정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협동설계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건축설계정보의 집적으로 이제 AI가 디자이너로 등장하는 시대에서 설계업이 공존하기 위한 체제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영국의 건축가 노먼 포스터 역시 '좋은 건축이란 많은 대화 속에서 시작되며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모임으로 이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한다. 과단한 공모전의 소모적 경쟁을 바꿔 보다 상생하며 상호 학습하고 서로의 지력을 모으는 성공적인 구축환경을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함께하는 변화 Co-working for change'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