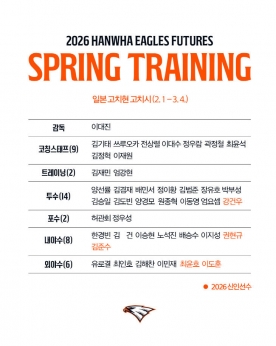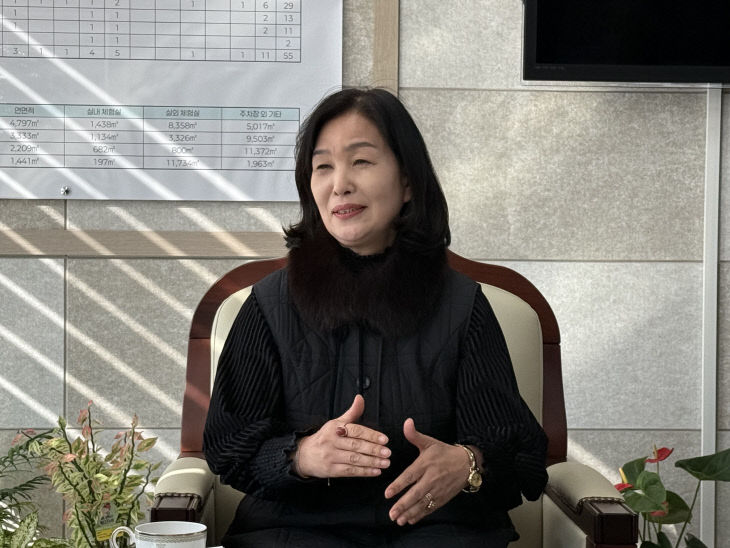|
| 여전히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현수막 외침은 여전하다. 사진=이희택 기자. |
부산시 입장에선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염원해온 숙원 사항의 반영으로 긍정적이다. 이에 반해 국가균형성장의 실질적 효과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더욱이 세종시는 행정수도 길목에서 역기류를 만나고 있다. 부정적 여파가 크게 다가온다. 해수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2005년 정부부처 고시 이후 8년 만인 2013년 세종시에 자리잡은 뒤 다시 12년 만에 입지를 바꾸면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작 옮겨야 할 초집중·과밀의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가장 약한 고리인 정부세종청사 부처들에 대한 흔들기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폐해는 대기업과 대학,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몰고 왔고, 2020년 사상 첫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기형적 국면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만만한 정부기관과 39만 신생도시인 세종시 흔들기만 되풀이하면서, 국가균형성장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란 미봉책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다른 시·도 입장에선 해수부 다음 정부부처 유치 시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실제 해수부 이전 흐름을 타고, '기후에너지부'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빼가기 시도가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더 이상의 (정부부처) 이전은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이나 도미노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해수부 이전의 부정적 나비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종시에 산재한 해수부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상 세종시)까지 동반 이전을 앞두면서, 상권 공실 최고 도시란 오명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빠져 나갈 경우, 그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다. 반면 부산의 원룸 물건은 현재 쏙 들어가고 임대료 상승세에 올라탔다.
 |
| 해수부 청사 앞에 내걸린 현수막. 이제는 어진동과 아름동 산하기관까지 빼가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해수부 내부 공직자들도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강도는 약해졌으나 세종청사 주변 현수막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해수부 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지난 7일 세종시 소상공인 및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해수부 지킴이단. 사진=지킴이단 제공. |
박윤경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침해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이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 분석 결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수부와 유관기관 종사자 1541명의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 지역경제 피해는 소비지출 감소 869억 원, 부동산 시장 손실 최대 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 30억 원 등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 원, 취업유발 감소도 연간 106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인해 수많은 세종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다. 헌재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란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