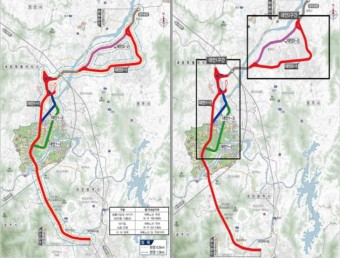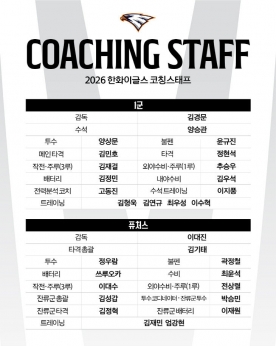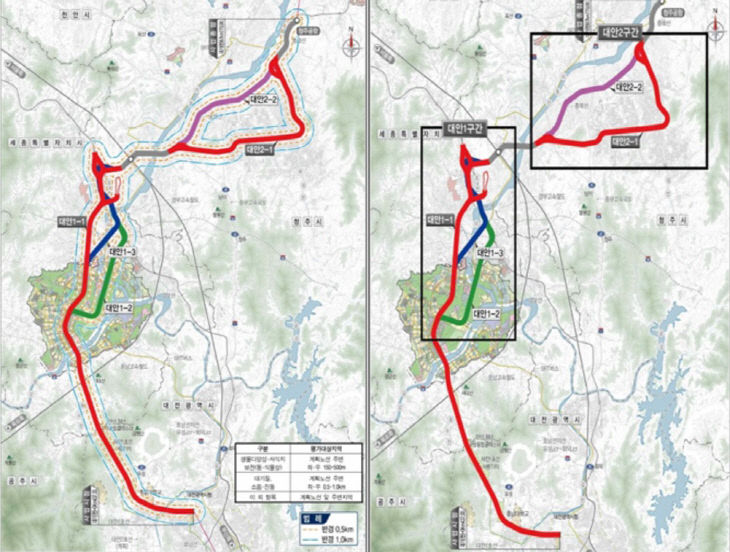|
| 영화 좀비딸 포스터. |
<부산행>(2016), <28년 후>(2025) 등 기존의 좀비물 영화들이 감염과 확대, 격리나 도피 등 사회적 파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면, 이 영화 <좀비딸>은 사회적 영향 관계가 거의 종결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남은 딸 수아를 어떻게 도피시키고,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거시적 공공성과 미시적 관계성의 중간에 아빠 정환이 놓여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므로 관객들은 그와 동일시되고, 그의 상황과 정서에 몰입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감한 정황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더구나 그는 친아빠도 아닙니다. 충분히 수아를 외면하거나 어느 선에서 포기하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공적 공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정환은 수아를 지키고 구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대중영화의 길을 가는 이 작품은 정환의 선택과 행위가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관객들이 공감하고 설득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본격적인 좀비물이기보다 한국 대중 영화의 특징 중 하나인 장르와 사회성의 결합에 가깝습니다. 상업적 장르물에 사회적 이슈와 정서를 담아내는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영화가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는 통로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울러 관객들 역시 영화를 통해 사회의 흐름과 정서를 공유하고 인식합니다.
정환의 희생을 통한 수아의 구원은 눈물겹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수아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이 외부의 수많은 치명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들을 지키거나 감염 상태로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기성세대의 강박을 보여줍니다. 한국 전쟁 후 기적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의 어른들에게 다음 세대가 겪는 혼란과 위험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무게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김대중 영화평론가/영화학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