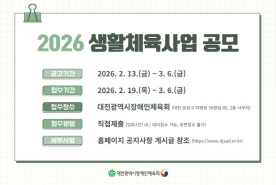|
| 윤희진 부국장 |
몸을 추스른 후에야 강제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내렸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주도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대학이 휴교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다음날인 5월 18일, 공수부대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대학에 투입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쫓아낸 것이다.
평생을 경제 분야 공직에 몸을 담았던 이 인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후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에 임명돼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물었더니, 반쯤 남은 맥주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고 주먹을 쥐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계엄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 2024년 하반기 들어 [2025 김종필 100년]이라는 기획취재를 준비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권은 냉전을 거듭했다. 타협 제스처도 없었다. 대화조차 없었으니 타협은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야권은 국정에 필요한 입법 거부와 예산 삭감으로 맞섰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서 '운정(雲庭) 김종필'(JP)을 떠올렸다. 마침 2025년이 JP가 출생한 지 1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 정치의 대명사로 평가받아온 JP의 정치 역정. 그의 출생 100년에 맞춰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충청의 중용’을 조명하기 위해 6개월간 보도하려던 프로젝트였다.
운정재단 사무실을 직접 찾아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고, 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함께 하기로 의결까지 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운정재단 이사회가 중도일보와의 공동기획을 확정한 날, 바로 그날이 2024년 12월 3일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몇 달을 고민했지만, JP가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결정적 이유로 결국 접었다. 구하기 어려운 책과 화첩 등을 적극 지원해준 운정재단 인사 대부분은 보수 지지층이지만, 그들의 한숨과 윤석열을 향한 성토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심리학자이기도 한 ‘차란 란가나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신경과학 교수는 올해 출간한 [기억한다는 착각]에서 ‘집단의 대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 오류를 다른 멤버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높고, 집단기억의 가장 나쁜 결과 중 하나는 왜곡이 한번 스며들고 나면 그것을 몰아내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부정선거 주장과 코로나19 사태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예로 들었다. 집단이 기억 오류를 확대해 전달하는 경향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데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일주일 전, 여전히 일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에 맞서 싸운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국힘 역시 윤석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보수 분열 만큼은 안 된다는 게 이유겠지만, 윤석열을 흘러간 과거로 인정하고 이미 떠나 보낸 보수 지지층과 당내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는 애증의 윤석열과 절연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 갈 길을 가라’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 지지층들의 요구일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 1년, 충청 출신 장동혁 국힘 대표의 첫 마디가 궁금하다.
윤희진 서울본부 부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아울렛, 봄 맞이 마케팅으로 분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6d/78_2026022601001958300084671.jpg)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7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