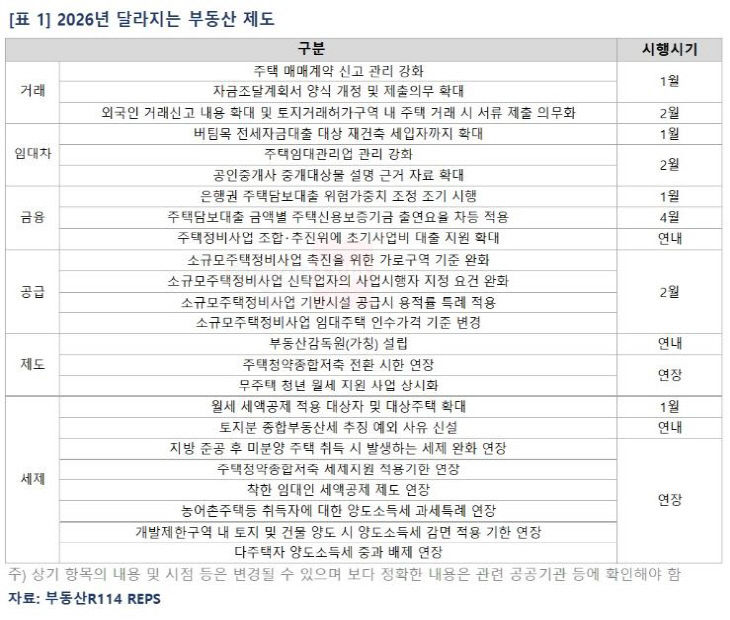|
| ▲ 필자의 바닷가에서 한때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통성명을 하면서 우린 쉬 명함을 주고받는다. 명함(名銜)은성명과 주소, 직업과 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쪽이다. 흔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을 알리기 위하여 건네준다.
처음으로 명함과 조우한 건 군복무를 마친 뒤 입사한 직장에서 명함을 만들어준 덕분이었다. 영업사원이다 보니 명함은 내근직 직원보다 많이 필요했다. 아무튼 남들보다 열심히 뛴 덕분에 가장 먼저 주임(主任)이 되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명함을 주었더니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어휴~ 벌써 주임이냐? 난 아직 취업조차 못 했는데.” 당시 대학졸업반이라던 친구는 이후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이후 더 부지런히 일한 보람으로 전국 최연소 사업소장으로 승진했다. 그러자 당연히 명함도 바뀌었다. “홍 소장님~”이라며 날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나 고와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더 이상의 순풍만범(順風滿帆)을 허락지 않았다.
회사가 부도난 것이다. 다른 회사로 이적했지만 더 이상 정규직은 없었다. 그로부터 ‘비정규직’이란 광야와 변방의 혹독한 ‘주홍글씨’ 나날이 점철되었다. 비정규직은 회사(법인이든 개인이든)와 고용주(雇用主)로부터 안정된 직무와 복지의 수혜 역시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마치 메뚜기처럼 이 직장 저 직장을 그야말로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이 힘들고 서글펐지만 현실은 칼바람인 양 냉혹했기에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흘렀고 그 세월의 ‘짬밥 수’에 따라 나의 바꾸어진 명함도 쌓여갔다.
작년 12월에 생애 최초로 책을 발간했다. 그러자 출판사 사장님께서는 참 고맙게도 저자용(著者用)이라며 명함을 수백 장이나 공짜로 박아주셨다. 그래서 홍보 목적으로 기존에 내가 인쇄하여 지참하고 있던 명함도 새로이 바꿨다.
소장이 되어 임용장과 명함을 받을 적엔 정말이지 역발산기개세와도 같은 일인당천(一人當千)의 의지가 용솟음쳤었다. 그러나 막상 이 풍진 세상을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정작 운칠기삼(運七技三)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경향성의 사실까지를 천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과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만들어줬다는 명함을 받았던 때가 풋풋하게 생각난다.
오늘은 모 언론사로 객원 논설위원(論說委員) 명함을 받으러 간다. 초복(初伏)에 걸맞게 평소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글을 쓰고 볼 일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홍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