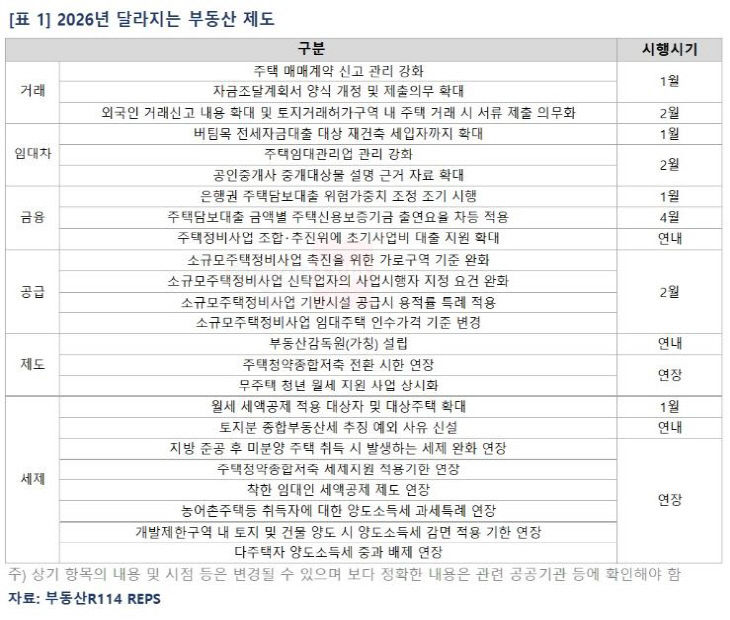|
| ▲ 게티 이미지 맹크 |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00일보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받은 전화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은 내일 자정까지라고 했지만 나는 성격이 급하다. 하여 어제 야근하면서 밤 9시도 안 되어 원고를 이메일로 송고했다.
담당 기자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지지로 보냈음은 물론이다. 기고와 투고는 다르다. 기고(寄稿)는 신문과 잡지(또는 기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냄을 이르지만 투고(投稿)는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을 뜻하는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는 글쓰기에 관한 한 이미 평가를 받은 사람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해당 언론과 기관의 편집팀 담당자(기자)의 낙점 여하에 따라 개재 여부가 판가름 난다. 나는 경비원이 직업이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되 우리나라 거개 경비원의 급여는 최저생활비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상쇄하자면 투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한동안 알바를 하였다. 그러나 잦은 야근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신이 멍들었는데 설상가상 육체노동까지 하자니 죽을 맛이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약값(치료비)이 더 많은 일종의 소탐대실(小貪大失) 현상에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것보다는 진정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그건 바로 글쓰기였다.
딱히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오래 전부터 정년이 없는 장르는 오로지 글쓰기뿐이란 결론이 섰다. 다행히 20년 전부터 습작을 해왔고, 14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나름의 내공이 있었다.
그 누구의 조력조차 없이 오로지 독학만으로 이뤄낸 그 결실로 말미암아 작년엔 생애 첫 저서까지 발간했다. 고작 초졸 학력의 경비원이 책을 냈다고 하여 단박 뉴스의 인물로 부상했다. 언론과의 잦은 인터뷰 덕분에 또 다른 언론사의 객원논설위원 자리까지 꿰찼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만의 사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또한 행복의 근거를 수확하는 것이다. 세월이 변하여 요즘 사람들은 당최 책을 보지 않는 세상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장거리 고속버스에서도 책을 보는 이가 안 보인다.
그러건 말건 나는 지금도 한 달에 최소한 100권의 책을 본다. ‘채식주의자’의 저자 한강 씨가 수상함으로써 유명해진 맨부커상의 또 다른 수상자 이언 매큐언(소설 ‘속죄’의 저자)은 하루도 거름 없이 600단어 이상 글 쓰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글을 잘 쓰는 데도 왕도는 실재한다. 그건 바로 매일 글을 쓰고 좋은 책을 보면 된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홍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