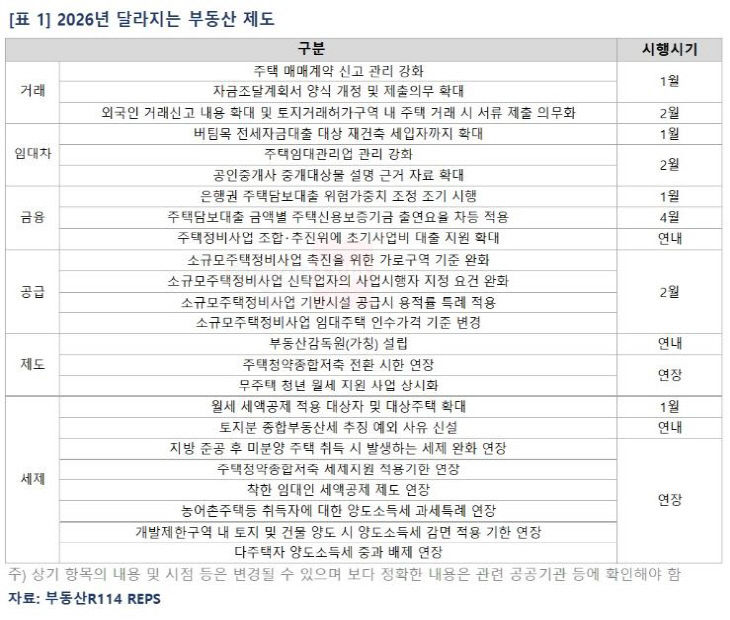|
언젠가의 일이다. 전화가 왔는데 응모한 모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시상식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그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말을 끌고 갔다.
“글을 너무 잘 쓰시던데 혹시 등단하신 건 아닌가요?” “네, 몇 년 전에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쩐지~ 죄송하지만 등단하셨다면 장원의 자격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럼 공모전 당시에 그러한 내용까지를 상세히 밝혔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길 하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돈을 받아낸 빚쟁이인 양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눈앞에서 장원에게 주겠다는 거금 200만 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등단 얘길 안 했으면 되었을 것을… 이란 후회가 잠시 해일로 몰려왔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아녀, 잘 했어! 되레 정직한 게 나로서도 떳떳한 거고.’ 8월19일자 모 신문에 <아마추어 백일장서 프로 작가가 수상해도 되나>라는 ‘독자 리포트’의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슨 지난 8월 6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세계평화안보 문학축전'에서의 백일장 1등 수상자가 기성 시인으로 밝혀지면서 문단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는 보도였다. 이 대회 수상으로 상금 500만 원을 탄 A씨는 한국시인협회 관계자를 통해 논란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모양새이지 싶다.
그래서 경험자의 시각에서 이 글을 쓴다. 내가 시민기자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지난 14년 전부터다. 그 덕분에 이제는 모 언론의 논설위원을 할 정도로까지 필력이 향상되었다.
그동안 각종의 문학공모전(온·오프라인)에 나가 상도 부지기수로 받았다. 한데 ‘아마추어 백일장서 프로 작가가 수상해도 되나’라는 기사처럼 대부분의 공모전에선 기성 문인과 아마추어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엔 아예 불참하면 된다.
작년에 첫 저서를 내기 전 어떤 출판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했다. "대한민국에선 시를 쓰면 굶어죽습니다. 그러니 시 대신 수필이나 소설을 쓰세요." 지난 5월,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으로 잘 알려진 최영미 시인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공개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녀는 시를 써서는 더 이상 밥벌이가 안 된다며, 하지만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는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했다고 우회적으로 탄식했다.
그녀가 오죽 답답했으면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강의를 달라고 애원까지 했단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위를 물으면서 국문과 석사학위도 없으면서 무슨 시 강의를 달라고 떼를 쓰냐며 무시했다는 글까지 올렸다.
최영미 시인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1994년 발표해 문학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시집은 현재까지 52쇄를 찍어 시집으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21년 만에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프로 작가조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다니 나와 같은 ‘초짜 작가’와는 비교조차도 불가능하다 하겠다. 나는 현재 여섯 곳의 매체에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두 곳은 원고료가 아예 없는 곳이며, 4곳 역시 그리 풍족한 원고료를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시인의 토로처럼 “2년 동안 시 60여 편, 원고지 30~60장 비평을 30편 넘게 발표했지만 다 합쳐 300만 원도 못 받았다. 생계를 위해 (시인 참여가 가능한) 여러 공모전 상을 받아 2000만 원가량 벌었다. 생계에 자존심을 파느냐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다. 10여 년 동안 밥 먹여 준 건 시인 타이틀이 아니라 공모전과 문학상뿐이었다”고 한탄했다는 부분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작년에 첫 저서를 낸 건 솔직히 일본 작가 구리 료헤이가 쓴 소설 <우동 한 그릇> 그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자 하는 욕심이 동인(動因)이었다. 그의 그 작품은 소설, 즉 허구인 반면 내가 쓴 <경비원 홍키호테>는 100% 리얼한 수기(手記)였기에 전하는 감동의 울림마저 다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착각은 자유라더니 인세의 수령은 커녕 빚만 잔뜩 진 허수아비 형국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상금이 걸린 공모전이라고 하면 열 일 제쳐두고 달려든다.
어쨌든 우리나라 작가(시인은 ‘작가’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편의상 표현하는 것이니 해량을 바라며)들의 생계비 벌이와 자존심의 양립(兩立)은 과연 불가(不可)한 것인가? 의문(疑問)의 먹구름이 앞을 가린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홍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