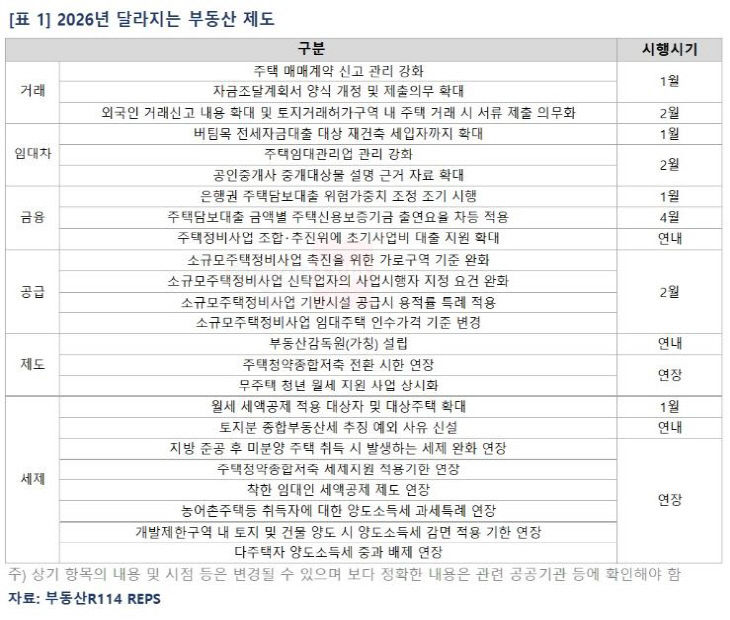|
| ▲ 사진=고대신문 |
오늘은 쉬는 날이다. 그러나 평소처럼 새벽 4시도 안 되어 일어났다. 여전히 한밤중인 아내가 깰까봐 도둑고양이처럼 냉장고를 열었다. 엊저녁에 먹다 남은 청국장찌개와 김치 등의 반찬을 꺼내 식탁에 차렸다.
그렇게 조촐한 식사를 한 뒤 양치질에 이어 목욕을 했다. 휴일임에도 그처럼 깔끔을 떤 까닭은 아내의 잔소리 덕분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깔끔해야 어딜 가더라도 구박을 안 받는 겨.” 벽시계가 오전 6시에 임박하자 창밖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올커니~ 신문이 왔구나! 늘 기다려지는 반가운 손님이 바로 신문이다. 집에선 두 종류의 신문을 정기구독한다. 회사에는 4가지의 신문이 배달된다. 고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여섯 종류의 신문을 보는 셈이다.
신문과 나의 인연은 아주 오래이며 또한 고래심줄보다 질기다. 그도 그럴 것이 소년가장이던 고작 열 셋의 나이 때부터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과 달리 당시엔 뉴스를 알자면 반드시 신문을 봐야 했다. 특히 그 즈음 내 밥벌이의 무대였던 천안역 앞엔 시외버스 차부가 있었다.
버스의 승객들은 무료함의 희석 차원에서라도 신문을 즐겨 사 봤다. 그때 신문 한 부의 값은 약 15~20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튼 신문을 다 팔더라도 반드시 한 부는 남겨서 집에 가지고 갔다. 이는 아버지가 보신 뒤에 나도 볼 요량에서였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신문 덕분이었을까...... 지금의 직업 이전에는 언론사에서만 얼추 20년 가까이나 밥을 먹었다. 요즘 사람들은 종이신문조차도 잘 안 보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휴대전화를 통한 포털사이트의 뉴스야 보겠지만.
반면 나는 지금도 종이신문을 사랑한다. 종이신문은 그 용도가 엄청나다. 그제 사온 청양고추를 어제 손질했다. 먼저 지난 종이신문을 거실의 바닥에 깔았다. 비닐 푸대에 담긴 고추를 그 위에 붓고 고추꼭지를 따면서 물수건으로 닦는 수순이었다.
스무 근이나 되는 양이었기에 3시간 가까이나 땀을 흘렸지만 올겨울 우리가 먹을 김장의 재료가 된다는 생각에 흐뭇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수사원’을 거론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은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시 주석의 그 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중국이 도와준 우리의 독립투사들까지를 염두에 둔 언중유골(言中有骨)의 작심 발언이었지 싶다.
신문에서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사진까지 실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화기애애한 모습이 역력했던 두 지도자의 냉랭함은 마치 엄동설한의 삭풍을 보는 듯 했다.
이러한 연유는 최대 현안인 우리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였음은 물론이다. 사드 문제는 예민한 문제라서 더 이상 거론치 않으련다. 다만 개인적인 ‘음수사원’ 만큼은 할 말이 있기에 이 글을 시작했다.
나의 음수사원은 바로 신문이다. 신문을 40년 이상이나 구독하다 보니 무식의 머리가 깼다. 또한 텅텅 비었던 지혜의 샘에도 항상 맑고 푸른 물이 철렁인다. 신문의 장점은 이렇듯 단순히 지식만을 제공하는 백과사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짜장면과 짬뽕 등의 배달음식을 시킬 때 바닥에 신문을 까는 건 상식이다. 책을 많이 보관하는 경우 책 중간 중간에 신문을 삽입하면 군내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다. 유리창을 닦을 때도 요긴하다.
지금이야 휴지가 넉넉하지만 과거엔 신문을 잘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사용했다. 한겨울에 길거리서 만나는 뜨거운 군고구마와 호떡 등은 별미다. 하지만 이를 먹거나 가져가려면 신문지가 필요했다. 신문은 그만큼 팔방미인이다.
바둑은 집내기를 할 때, 그리고 화투는 문지방을 넘을 때 안색을 보면 대번에 ‘자초지종’을 안다고 했던가. 이런 관점에서 신문은 여전히 지식과 지혜의 백과사전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홍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