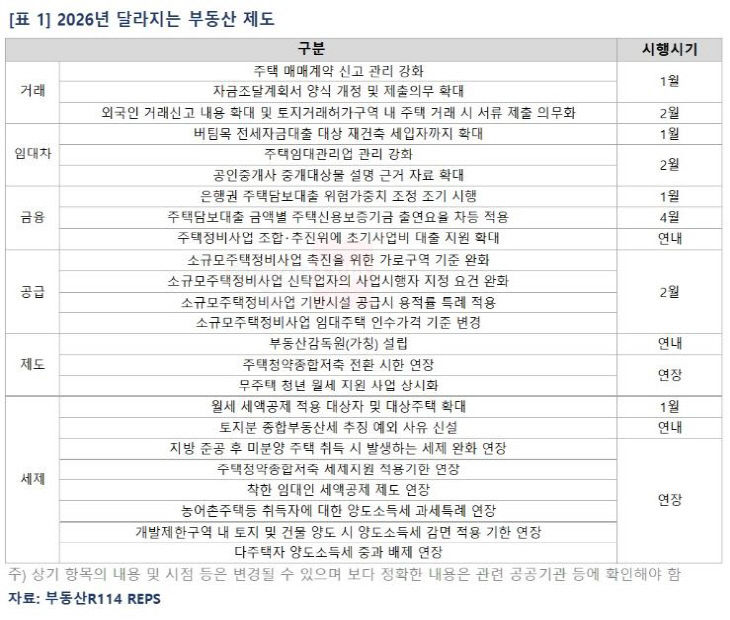|
| ▲ 게티 이미지 뱅크 |
그제 경기도 일산에 사는 동향(同鄕)의 죽마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는 언제니?” “응, 10월 9일이지, 왜 너도 참석하려고?” “아니, 그냥 네 안부가 궁금해서.”
“원 싱거운 녀석 같으니라고. 그건 그렇고 지난 추석엔 천안에 왔다 갔니?” “바빠서 그만 못 갔어. 처가(妻家)도 마찬가지고.” “누군 안 바쁘니? 그럴수록 더 자주 내려와서 친구들도 좀 만나자꾸나. 이러다간 길거리서 널 봐도 못 알아보겠다.”
“알았어, 술 작작 마시고 건강해라.” 전화를 한 그 친구는 자타공인의 애처가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에도 고향 본가(本家)에 이어 처가에도 갈 수 없었다는 건 그 친구의 경제적 궁핍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에 다름 아니었다.
“그나저나 온양엔 다녀왔니?” 유일한 집안의 어르신인 숙부님께서 사시는 아산(온양)을 그 친구가 되짚는 질문이었다. “추석에도 일해야 하는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다녀왔다.” 연전 작고하신 숙모님으로 말미암아 숙부님의 올 추석 전의 표정은 여전히 허우룩(마음이 매우 서운하고 허전한 모양)하셨다.
또한 외출을 나가신 터였음에 약간을 기다렸다가 뵈어야 했다. “어디 다녀오세요?” “추석이 코앞인데 하지만 네 작은어머니가 부재(不在)한 상태가 다시금 마음을 바늘처럼 후벼 파기에 저수지(신정호)에 가서 심란한 맘을 달래고 왔다.”“……!”
언젠가 숙모님께서 살아계실 적의 설날에도 아산을 찾았으나 평소 자주 다니신다는 사찰에 가시어 두 분 어르신 모두 안 계셨다. 전화를 드렸더니 늦게 집에 도착 예정이니 그냥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준비한 선물의 안에 내 명함을 넣으면서 명함의 뒤엔 간략하나마 못 뵙고 가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길이었음에도 숙부님과 숙모님을 모두 뵙지 못 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아쉬워 불평을 내재한 퉁퉁걸음(발로 탄탄한 곳을 자꾸 세게 구르며 빨리 걷는 걸음)을 거듭했다.
아무튼 두 분 어르신을 뵙지 못 하였으되 어쨌든 내가 왔다 갔노라는 표시는 하였기에 이는 그렇다면 어떤 세함(歲銜)인 셈이었다. ‘세함’은 예전 서울이나 지방 관아의 군졸 등이 설날에 상관의 집에 문안을 드리고 그 증표로 명함을 놓고 오던 일을 의미한다.
또한 상관의 집에서는 이를 받기 위하여 문간의 적당한 곳에 칠기(漆器=옻칠을 한 나무 그릇)를 비치하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말은 이처럼 오묘하면서도 참 웅숭깊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우리말은 부지기수로 많다. 고운 말이 너무도 많은 까닭에 조금만 ‘맛보기’ 하겠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식어서 차가워진 밥이나 국수를 먹으려면 ‘토렴(밥이나 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여 덥게 함)’을 하여 먹어야 한다.
‘온새미로’는 자연 그대로, 즉 언제나 변함없이 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며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는 의미이니 올해는 이 기조(基調)를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더 좋은 일이 거듭될 수도 있을 듯 싶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도 사용치 아니 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며 ‘그림의 떡’이다. 참 아름다운 우리말, 자주 사용하고 볼 일이다. 오늘은 ‘한글날’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홍경석
홍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