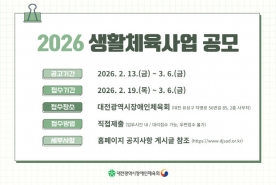지역별 외국인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를 보면 늘 한발 늦은 방역 대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거주시설에 치중하다가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실내 작업 시 마스크 착용 및 식당 내 거리두기 등에 구멍이 생기는 식이다. 언제 터질지 아슬아슬한 지역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 사업장도 일대일 비대면 점검을 걸러서는 안 된다. 각 지방노동청 특별점검팀 등을 통해 지역별 점검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험했듯이 코로나19는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고용업체나 기숙사 거주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관리가 허술하면 취약 사업장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현재 16개 번역된 언어로 방역 자료를 발송 중이지만 긴급재난문자를 받고도 해독이 불가능한 사례가 42%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국내에 거주한다면 백신 접종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게 좋다.
이 기회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오해와 편견의 불편한 시선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지역 외국인 대상 조사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차별과 편견이 심해졌다는 의견이 36%에 근접했다. 그 누구에게라도 낙인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외국인 확진자는 올해 누적 1747명으로 국내 발생의 6.6%를 차지한다. 연쇄적인 외국인 노동자 감염은 관리 부실 탓이 크다. 일시적인 집단감염 뇌관이 된다고 외국인 혐오증이나 차별로 번진다면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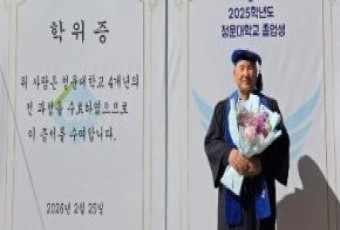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8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