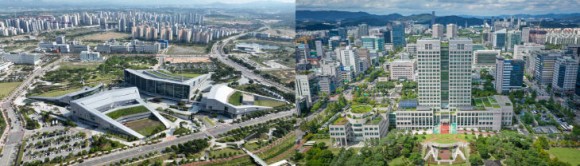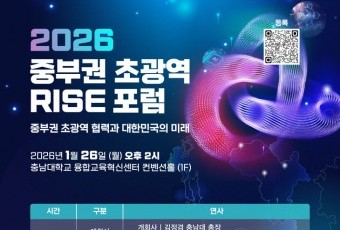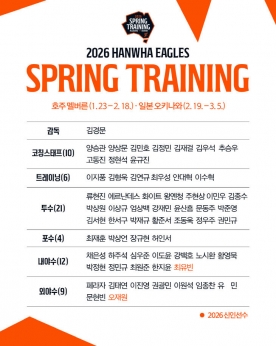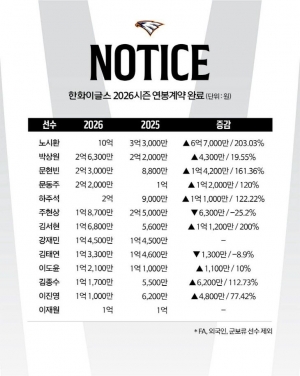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
| 우창희 뉴스디지털부장(부국장) |
2000년대 후반 포털의 등장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보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다음날 눈이 충혈돼 출근하기 일쑤였다. 2010년대는 네이버와 다음 뉴스가 제공하는 '검색어' 뉴스가 전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매일 새롭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검색어에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았다.
2020년대 들어서는 AI 시대가 열렸고, 5년이 흐른 지금은 일상 곳곳에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다. 멀티미디어의 발달도 한몫했다. 유튜브는 네이버 다음으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급격한 성장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인터넷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정보습득을 위해서 신문과 방송이 절대적이었다. 지금은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한다. AI기술이 더 쉽고 간편하게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게 만들어 줬다.
기자처럼 기사도 만들어 낸다. 수 년간 교육받고 취재활동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 기사들도 몇 분이면 '뚝딱' 하고 만들어 진다. AI에게 조건 값을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는 과거 기사복제 'Ctrl C, Ctrl V'와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했다.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를 더 쉽고 빠르게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포털(네이버, 다음)의 정책이 페이크 뉴스의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한다. 뉴스 중심으로 정보전달을 하던 포털이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의 개인화 서비스를 한 후 트래픽 발생을 증폭시키기 위해 전진배치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뉴스보다 더 비중 있게 배치했다.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는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을 만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추측성이 난무하는 글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화면을 도배하게 놔뒀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네티즌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뉴스 정책도 실패라고 생각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네이버에는 800개의 매체가 뉴스를 공급하고, 다음 뉴스에는 1200개의 매체가 등록되어 뉴스를 공급한다. 하루에 수만 개의 뉴스가 포털에 송출되는 구조다. 네이버 기준으로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는 4건이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의 알고리즘(정확도, 신뢰도 등)에 맞춰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된다. 언론사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듯 메인이나 뉴스검색 상위에 기사를 노출하기 위해 혈안이다. 인터넷 매체들은 트래픽이 매출에 기여하는 비율이 높기에 포털에 입점 심사를 통과한 이후 매체 성향과 다른 기사들을 송출해서라도 트래픽을 끌어모은다.
검색품질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점통과 후 정기적으로 매체심사를 진행해 관리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독자들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
필자에게 AI기자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라고 복수의 기업들이 메일을 보내온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하루에 더 많은 기사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세한 인터넷 매체들이 다수 사용한다고 들었다.
다음뉴스는 지난해부터 자체심사를 통해 콘텐츠 제휴사를 늘리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2만6700개 정도가 있다. 인터넷매체는 1만7000개라고 한다. 이중 약 2만 개의 매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요청한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를 늘리기 이전에 기존에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가 저널리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검열해야 한다고.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창희 기자
우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