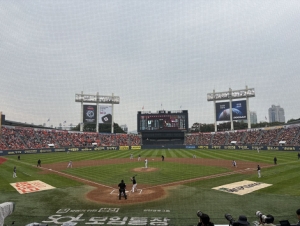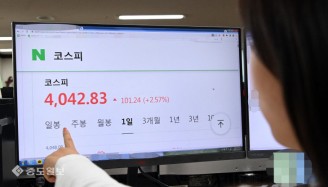|
| 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그러나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더는 굶주리는 사람은 없지만, 식량자급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여기에 곡물 자급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9.5%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식량안보의 위협은 커진다. 즉 우리의 식량 체계는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식량안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최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지만, 탄소 배출과 기후대응, 생태계 영향까지 연결돼야 한다. UN SDGs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동으로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물공장, 스마트팜, 수직농장, 생명공학, AI 기반 농업기술 등이 미래 농업의 해답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첨단 기술은 분명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며, 한정된 토지와 노동력 문제를 극복할 힘을 가진다.
그러나 SDGs는 생산성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환경적 영향, 사회적 형평, 경제적 순환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최첨단 농업은 본질적으로 생산 효율과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생산량 측면에서 식량안보를 충족할지 몰라도, SDG 12번(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SDG 15번(육상 생태계)을 함께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토양, 생태계, 지역 먹거리 체계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기술 중심의 효율성 논리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UN SDGs는 소농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SDG 10)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첨단 농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와 기술 장벽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과 일부 지역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고, 농업 분야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격차가 농민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SDGs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같은 식물공장은 물 절약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된다면, 온실가스 감축(SDG 13)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탄소 배출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
UN SDGs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지역 기반 먹거리 체계, 공동체 참여, 순환경제, 소농 포용, 생태 복원이다. 첨단 기술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 그 자체는 아니다. 기술은 지역 생태, 농민 주권, 공정한 먹거리 체계 위에서 작동할 때에만 SDGs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농업은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는 농업을 뒤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농업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농사가 중요하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농업이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는 의미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첨단 농업은 유효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철학으로 사용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결정해야 한다. 기술, 생태계, 공동체가 결합 된 농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첨단 농업기술도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다./최병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