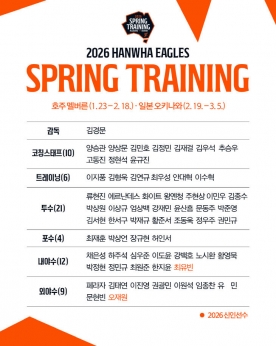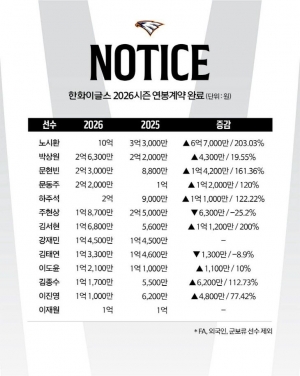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
| 광석초 교사 성주경 |
교직에 몸담은 지 어느덧 20년.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교직 사회가 세상의 변화에 참 둔감하고 느린 곳이라는 탄식이었다. 하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한 지금 내가 느끼는 교실은 그 어느 곳보다 변화의 유속이 빠른 곳으로 바뀌었다.
누구에게나 학교는 공통의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칠판, 책상, 그리고 선생님. 누구나 학교라는 이름 아래 비슷한 기억을 품고 살았다. 요즈음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상이 교실을 바라보는 눈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아이들이 20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을 때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 오늘 마침 용돈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예전에는 "내가 사줄게"라고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요즘 아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꼼꼼히 받는다. 어른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만한 일이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보는 입장은 이를 무조건 '개인주의'라며 비난할 수는 없다. 단순하게 그것이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렇게 세상이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학부모 세대의 변화도 자리 잡고 있다. 한두 자녀가 대부분인 시대, 많은 학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처음인 '초보'다. 다자녀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익혔을 보호자의 역할이 지금은 낯설고 어려운 고민거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돌봄 기능과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느낀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사실 학교 교육은 결국 가정 교육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가정에서 배운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에서 괴리를 느끼는 것은 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에서 나는 학부모 상담 때마다 늘 한 가지를 강조한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오로지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최근 우리 광석초 4학년 아이들과 함께한 텃밭 가꾸기 활동은 그 '성장'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구역에 상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수확의 기쁨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아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뜨거운 햇살 아래 텃밭의 흙이 말라가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석한 친구의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생님, 민수(가명)가 없어서 상추가 다 시들 것 같아요. 제가 물 대신 줄게요."
며칠 뒤, 수확의 날이 왔다. 풍성하게 자란 상추를 갈무리하던 아이들은 자기 봉지의 일부를 떼어 결석했던 친구의 몫으로 챙겨두었다. 과자 한 입을 먹을 때도 '빌려준 돈'을 생각하던 아이들이 땀 흘려 가꾼 수확물 앞에서는 기꺼이 '친구의 자리'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힘이자 성장의 모습이다. 다툼이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상담 때 나는 학부모들에게 말한다. "이 자리는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라고.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실수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 공동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다.
오늘도 텃밭의 채소들은 아이들의 서툰 손길 속에서 꿋꿋이 자라난다. 세상은 변하고 아이들의 모습도 달라졌지만, '교육은 성장을 향한다'는 그 본질만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의 이정표다.
오늘도 교실의 문을 열며 다짐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상처보다 성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