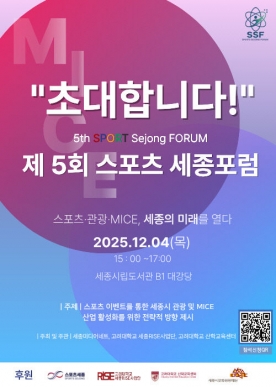|
| 원앙. |
대둔산에 서식하는 동·생물 1488종 중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10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대둔산도립공원 24.77㎢에 대한 자연환경 파악 자연자원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둔산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488종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자연 9개 분야, 문화자원, 탐방행태 등 인문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했다.
1488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물이 910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유류 14종, 조류 100종, 양서류 11종, 파충류 11종, 담수어류 37종, 곤충류 21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91종 등이다. 이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은 10종이다.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석곡과 희귀생물인 금붓꽃, 너도바람꽃, 태백제비꽃, 미치광이풀, 광릉골무꽃, 뻐꾹나리 등 희귀식물 9분류군과 적색목록 5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꿩의다리, 털중나리 등 한반도 고유종 18분류군, 키버들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31분류군, 사람주나무 등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1분류군 등도 서식을 확인했다. 또 유럽점나도나물, 족제비싸리 등 외래식물 39분류군, 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교란식물 3분류군도 서식하고 있었다. 포유류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삵과 담비가 서식 중이다.
조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참매,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벌매와 새호라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원앙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대둔산 수락계곡과 태고사 일대에는 큰유리새와 쇠유리새, 산솔새, 벙어리뻐꾸기, 검은등뻐꾸기 등 다양한 산림성 조류가 번식 중이다.
양서·파충류 가운데에는 취약종인 이끼도롱뇽과 준위협종인 참개구리, 국가 기후변화 지표종인 북방산개구리와 계곡산개구리, 한반도 고유종인 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등이 확인됐다. 담수어류로는 참갈겨니, 참종개, 동사리 등 한국고유 3종, 모래무지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4종이 조사됐다.
곤충류 중에서는 민줄딱정벌레, 묘향산거저리, 고마로브집게벌레, 산바퀴 등 한국 고유종 13종과 사시나무잎벌레, 왕파리매, 풀색노린재, 쇠측범잠자리 등 국외 반출 승인 대상 14종의 서식을 관찰했다.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는 연가시, 주름다슬기, 맵시하루살이, 대륙뱀잠자리, 둥근날개날도래, 갈색우묵날도래 등의 서식을 확인했다. 대둔산 내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 5건과 비지정문화재 39건 등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둔산은 충남도의 대둔산도립공원과 전라북도의 대둔산도립공원으로 나뉜다. 먼저 충남도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은 24.54㎢이다. 대전 남쪽 약 50㎞ 지점에 위치하며,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동쪽에 오대산(569m), 서쪽에 월성봉(649m)이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쪽의 대둔산도립공원과 접한다.
전라북도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은 38.1㎢이다. 전주시 북동쪽 약 55㎞ 지점에 위치하며, 1977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동쪽에는 오대산, 북서쪽에는 월성봉, 남쪽에는 천등산(天燈山:707m)이 솟아 있으며, 북쪽은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과 접한다. 남쪽으로는 금강의 지류인 장선천(長仙川) 상류가 협곡을 이루면서 흐른다.
대둔산은 노령산맥 북부에 속하는 잔구 가운데 하나로, 침식된 화강암 암반이 드러나 봉우리마다 절벽과 기암괴석을 이루는데, 특히 정상의 임금바위와 입석대(立石臺)를 잇는 길이 81m, 너비 1m의 금강구름다리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대둔산 낙조대(落照臺)에서 맞는 아침 해돋이와 낙조 또한 유명하다.
그 밖에 이치전적지(梨峙戰蹟地:전북기념물 26) 등의 문화유적과 장군약수터·행정저수지 등의 볼거리가 있다. 사찰로는 남서쪽 협곡에 안심사(安心寺)와 그 말사인 약사(藥寺), 그리고 동쪽의 태고사가 있다. 안심사는 운주면 장선리 북동쪽 5㎞ 지점에 있는데, 6·25전쟁 때 불에 탔으나 사적비(전북유형문화재 110), 석종(石鐘) 계단을 비롯하여 부도 및 부도전(전북유형문화재 109) 등이 남아 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기획] 민선8기 충남도 외자유치 41억 달러 돌파… "남은 기간 50억 달러 목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7d/78_20251207010006611000270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