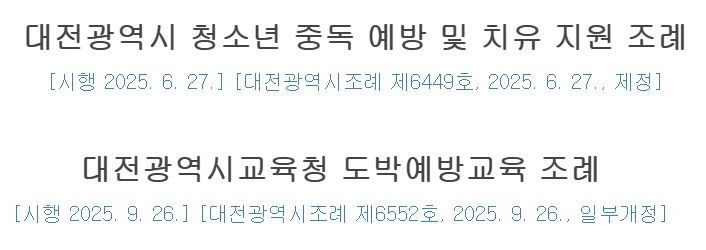|
| 2024년 5월 개최된 제36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사진=대전미술협회 제공 |
행정당국의 집행 관리 부실과 시의회의 검증 미비 등으로 한때 무산위기까지 몰린 것인데 지역 예술계에선 이같은 구조적 허점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제37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이하 대전미술대전)은 대전시립미술관 대관 과정에서 미술관 운영위원회 정족수 미달, 협회 관계인 포함 등 절차상 문제가 한 차례 불거졌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최 측의 영리성을 주장하며 출품작 4000점, 출품료 2억 원이라는 수치가 사실인 양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출품작 약 1500점, 출품료는 1억 4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승인됐던 시립미술관 대관이 돌연 취소되면서 대전미술대전 주최자인 대전미술협회는 이미지에 생채기를 입었을 뿐 아니라 당장 다가오는 전시 대관마저 불투명해지며 무대를 지켜내야 하는 현실적 벼랑끝으로 몰렸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전미술협회가 진행했던 타 행사에서는 협회의 잔액 정산과 집행 내역 공개가 미흡해 신뢰가 흔들린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문제들이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과 의회, 현장 절차 전반에서 되풀이됐다는 점은 책임과 감독이 분리돼 있으면서도 상시 점검은 미흡한 지역 문화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이번에 출품비를 전액 시로 환수하고, 운영비는 시가 선지급해 대전문화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손질했다. 모든 예산을 재단에서 집행하고 시에서 총괄 관리해 공공예산의 흐름을 이중으로 감시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역 미술계에서는 "구조만 바꿨다고 모든 신뢰가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방식이 한 번 바뀌었다고 해도 상시 점검과 공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비교 사례인 광주비엔날레는 매년 재단 이사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공식 심의·의결한다.
2012년 기준 67억 원 규모 예산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됐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지자체·재단·이사회가 삼중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갖췄다.
예산과 운영을 재단에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 심의·정기 공시로 신뢰를 담보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은 가까스로 이번 대전미술대전 무대를 살렸지만 공공지원 구조가 허술하면 지역 예술생태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제2의 대전미술대전 사태를 막으려면 문화행정이 한 번의 구조 손질에 그치지 않고 상시 점검과 공공성 강화 체계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보다 제대로 쓰이고 끝까지 관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55.jpeg)






![[독자제보] "가게 닫고 나니 진짜 지옥" 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78_20260209010007915000329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