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룡시 방영체험관.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신도안 하면 종교 집성촌으로 널리 알려 진 곳인데, 1914년에 연산군 식한면 30개 리, 두마면 14개 리, 진잠군 하남면 우명리와 서면 월저리 일부가 병합되어 논산군 두마면으로 개편되었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신도안이 새로운 도읍지라는 조선시대 이래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온 예언서『정감록(鄭鑑錄)』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과 시천교 교인 2000여 명이 신도안에 집단으로 이주해와 1924년에 신도안의 인구는 1639가구 7256명이 되었다.
조선 태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이 계룡산 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친히 와서 순시하고 길지를 택하여 대략 그 기지를 정하고는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국 조운(漕運)의 길이 멀다 하여 그만두었다. 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8권(卷18) 충청도(忠淸道)연산현(連山縣) 계룡시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 1989년 7월에는 신도안 지역에 국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이전되어 자주국방의 요람지로 변모하였다.
계룡시를 가려면 대전∼논산 간의 1번 국도나 호남고속국도지선에 계룡 나들목이 개설되어 있어 대전 · 논산 · 공주 방면으로의 도로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호남선이 지나면서 계룡역이 설치되어 있어 철도교통 또한 편리하다.
우선 계룡시에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2-4에 자리한 사계 고택이 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며 율곡(栗谷) 이이(李珥)선생의 적통(嫡統)을 이어받은 예학의 대가로, 『가례집람(家禮輯覽)』, 『상례비요(喪禮備要)』 등 예학서를 저술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1548∼1631)선생이 살던 집으로 사계 선생이 말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살면서 아들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 후학을 양성한 곳이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사랑채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대문 옆으로 길게 붙은 문간방은 현재 사계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계 선생의 일대기와 유물을 비롯해 그의 스승과 제자들을 살펴볼 수 있다.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에 가면 괴목정(槐木停)이 있다. 이곳에 수령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보호수 세 그루가 있는데, 사실 괴목(槐木)이란 '느티나무' 또는 '회화나무'를 뜻하는 한자어다. 그러나 수종(樹種)의 이름을 뛰어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번잡한 곳을 피해 길지로 알려진 지금의 신도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신선객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갔는데, 한날한시에 모여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괴목(槐木)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을 괴목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기 전, 신도안을 새로운 수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무학대사가 이곳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지팡이를 땅에 꽂아 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났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며 그 나무가 거대한 괴목이 되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지금도 계룡시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의 시원한 쉼터가 되고 있다.
한편 계룡시는 엄사면 향한리에 있는 향적산에 산림청으로부터 50만㎡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받았다.
계룡시는 우수한 산림환경과 아름다운 숲 경관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 치유공간을 조성하였다.
동행데크길,치유향기원, 명상쉼터, 다양한 숲길 등에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가능하다.
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향적산 나를 품다', '도란도란 숲', '선물의 숲', '챌린지 숲', '마음정원 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직장인, 가족,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치유의 숲을 들른 후 가까운 계룡시 엄사면 향적산길 129에는 무상사라는 아담한 사찰을 들르는 것도 좋겠다. 이곳은 외국인 스님들이 머무르며 한국불교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간의 집중 선(禪) 수행 안거(安居0를 실시한다.
여름에 열리는 수행을 하안거 겨울에 열리는 수행을 동안거라고 하며 그 외 해제 기간에는 다양한 사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 주말 안거, 특별행사,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일반인을 위한 법회, 젠 카페, 경전반도 주최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와 한국어로 운영된다.
 |
| 정연식당. (사진= 김영복 연구가) |
들어가자마자 고풍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의 계룡맛집 대기실이 있는데, 웨이팅이 걸리거나 방문 포장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다.
매장 내부가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며, 매장이 아주 넓고 룸도 있어서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도 좋다.
이른 새벽 매장 주방에서 직접 끓이는 감자탕과 해썹 인증받은 고춧가루로 매일 직접 담그는 겉절이와 깍두기가 깔끔하고 맛이 있다.
맥반석불뼈구이와 목뼈해장국과 솥밥을 주문을 해 봤다. 우거지가 들어간 목뼈해장국은.살이 정말 많이 붙어 있다.
뜨거운 맥반석 돌판에 바글바글 끓어오르며 단짠 불맛 사정없이 풍기며 후각을 마구 자극하는 맥반석불뼈구이는 도톰한 살코기에 매콤한 양념의 조합이 아주 맛있다. 살코기를 발라보는데! 목뼈 특유의 보드라운 육질이 전해 지며, 떡도 들어가 있는데 살짝 튀긴 떡이라 식감이 아주 좋다.
그리고 감자탕에서 감자를 빼고 1인용 뚝배기에 담으면 뼈해장국이다. 즉, 같은 요리지만 다 인분으로 내놓으면 감자탕, 1인분으로 내놓으면 뼈해장국이 되는 식이다.
 |
| 맥반석 불뼈구이.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영조 9년(1733)11월 12일자를 보면 영조 임금이 별제상에서 약방이 입진하는 자리에 제조 송인명 등이 입시하여 진맥하고서 약을 의논하는 자리에 김응삼이 아뢰기를, "여염의 사람들은 현기증이 있으면 음식으로 보양하는데 그 방도로 우골(牛骨)만 한 것이 없으니, 그 효과를 본 사람도 많고 방서(方書)에도 언급하였습니다."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고(故) 판서 이광적(李光迪)은 나이가 90세에 가깝도록 다른 양생법(養生法)은 없고 매일 아침 우골탕 한 보시기에 술 한 잔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계사년(1713, 숙종39)에 강화도에 갔을 때 먹어 보고서 맛이 좋았으므로 항상 즐겨 먹었는데, 요즘은 비위(脾胃)가 예전과 달라서 먹을 수 없다." 하였다.
『일성록(日省錄)』정조 19년(1795) 1월 21일자에는 자전(慈殿), 자궁(慈宮), 내전(內殿)이 경모궁에 나아가 전작례(奠酌禮)를 행할 때 우골전(牛骨煎)과 우골탕이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렇지만 돼지뼈를 이용한 음식은 보이지 않고, 다만 돼지뼈는 선조 때 양예수(楊禮壽,~1597)가 편찬한 『의림촬요(醫林撮要)』에 말의 간과 각종 말린 고기에 중독된 데에 돼지뼈를 태운 가루를 먹는다고 나온다.
1972년 11월3일 [경향신문] 기획연재 겨우살이 지혜 '돼지고기 조리'에 감자탕이 처음 등장한다.
"감자탕도 술 안주 뿐만 아니라 밥반찬으로 특별한 맛이 있다. 통감자와 돼지고기 뼈를 썰어 넣고 곰탕 고듯 푹 고아서 소금장이나 양념장을 곁들이면 한결 부드러운 영양식이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감자탕은 이렇듯 70년대 초에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6년 1월29일 [동아일보]의 조선작(趙善作)이 쓴 연재소설 '바람의 집'에 감자탕이 서민들의 술 안주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온다.
"상가의 뒷골목 허름한 술집이었다. 감자탕과 소주를 시켜놓고 그들은 마주 앉은 것이다. 둥그런 철제 테이블 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연탄 화덕에서는 아직 덜 핀 구멍탄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당시 연탄화덕에 감자탕을 데우며 소주를 마시는 정경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이 감자탕이 90년대 들어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언론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기 시작 한다.
 |
| 목뼈해장국.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영등포구 독산동에는 도살장의 영향으로 영등포역 주변에는 감자탕집들이 많았다.
1970년대 초반 영등포역 주변의 감자탕 가게에서 판매한 감자탕의 경우 지금의 감자탕에 포함되는 알이 큰 감자가 아닌 작은 감자가 잔뜩 들어가 있었다. 즉, 감자 자체가 가격이 높아지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감자를 과거에 비해 적게 넣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하여 감자탕이라는 이름을 갖게되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설이 있으나 양돈 협회와 육가공 종사자 모두 '돼지에는 감자라는 부위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자뼈' 설은 감자탕집에서 떠돌던 민간 어원이 마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인 것처럼 둔갑한 사례가 확실해 보인다.
감자뼈설이 퍼지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으로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가 급부상하던 무렵 네이버 메인에 지식iN에 올라온 베스트 답변에 감자탕의 어원에 관해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불러 감자탕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감자는 돼지 등뼈를 일컫는 말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닭을 이용한 백숙을 끓이거나 돼지뼈탕에 감자가 들어간다. 돼지뼈탕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감자를 넣다 보니 감자탕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김영복 식생활연구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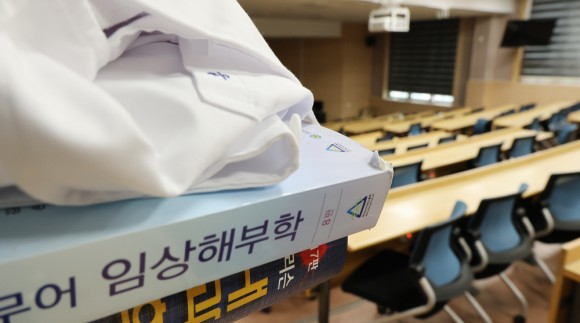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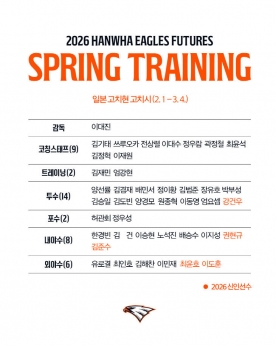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1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