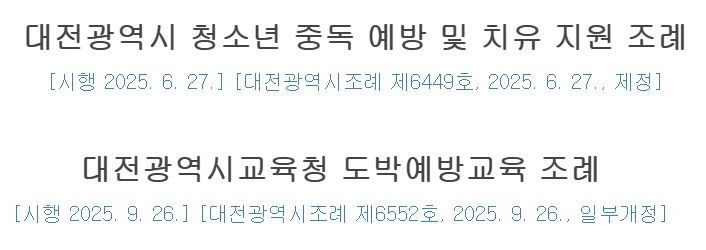|
| 오진화(도시 문화관광콘텐츠 기획자) |
오늘날 도시브랜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니라 '왜 머물렀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돌아갔는가'에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경관 정비를 넘어, 도시가 품어온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문화관광 전략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대전 동구 인동의 헤레디움은 이러한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헤레디움은 1922년 설립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을 복원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식민지 시기 수탈의 거점이었던 이 건물은 해방 이후 금융기관과 공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거쳐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후 충분한 고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복원이 이뤄졌고, 2023년 전시와 공연, 담론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의 가치는 단순한 '보존'에 머물지 않는다.
헤레디움은 과거를 설명하는 전시관이 아니라, 관람객이 그 시간을 직접 체감하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건축의 비례와 동선, 빛과 소리의 흐름은 빠른 관람과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체류를 전제로 한다. 이는 체류형 관광과 슬로우 투어리즘이 지향하는 핵심 조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전시와 프로그램 역시 단기적 흥행보다 경험의 축적에 초점을 둔다.
로랑 그라소 개인전처럼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명사의 균열을 다루는 전시는 이 공간이 지닌 식민의 역사와 중첩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사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은 도시를 소비의 대상이 아닌 기억의 장소로 인식하게 하고, 관람 이후에도 오래 남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관광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지점은 헤레디움이 '단독 방문지'가 아니라 도시 문화관광 전략의 출발점, 즉 앵커 포인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헤레디움을 기점으로 인동·대동 일대의 근대 건축 자산과 원도심 골목, 지역 예술 공간과 생활 상권을 하나의 문화관광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동선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밀도다. 대규모 시설이나 이벤트가 없어도 역사적 공간과 예술 콘텐츠, 일상의 골목과 지역 상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도시는 살아 있는 관광지가 된다. 이는 관광객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모델이기도 하다.
특히 2026년 대전·충남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헤레디움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분명하다. 통합 이후 대전은 행정과 산업 중심지를 넘어 충청권 문화 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헤레디움은 대전의 근대사와 산업사, 그리고 오늘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 공간으로서 통합 대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신규 관광자원을 무한히 만들어내는 방식보다. 이미 존재하는 도시의 시간을 해석하고 연결하는 전략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
새로움을 반복하는 도시보다 축적된 시간을 해석할 줄 아는 도시가 오래 기억된다. 헤레디움은 대전이 ‘지나치는 도시’에서 ‘머무르며 생각하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다.
도시재생 공간을 연결하지 못하면 관광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다. 그러나 연결에 성공하면 관광은 정책이 된다.
축적된 시간을 품은 도시는 오래 기억되고, 그 기억은 다시 도시를 찾게 만든다.
오진화(도시 문화관광콘텐츠 기획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