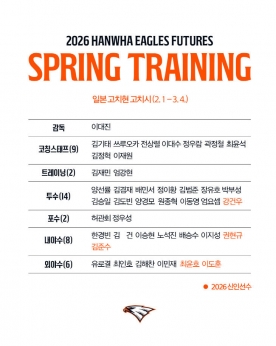욕망과 두려움,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는 신화를 통해 대전을 새로이 바라보려 합니다. 무심히 지나다녔던 삶의 터전에서, 인류의 오래된 지혜를 찾아보는 이 시간이 부디 흥미롭고 유익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서 발견된 농경문청동기 뒷면과 앞면 /출처=국립중앙박물관 |
흔히 대전을 근대의 도시라 부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철도 부설과 대전역 건설, 뒤이은 충남도청 이전이 한가로운 마을을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시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전은 청동기문화를 꽃피운 수준 높은 유물들을 품어온 유구한 역사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중 괴정동은 다량의 유물과 함께 최초의 한국식동검이 출토된 의미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는 정식 발굴이 되기 전 세상에 나와 고물상의 손을 거쳐 알려지게 됐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이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기록조차 없던 시대를 살아가던 선사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가로 7.3cm, 세로 12.8cm의 크기로 남아있는 농경문청동기는 대전이라는 공간을 신화적 서사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 몸으로 따비를 들고 밭을 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에 깃털장식을 한 그의 곁에는 토기에 무언가를 담는 여인이, 다른 면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새가 솟대위에 앉아 있지요. 손바닥만한 청동판 위에 담겨진 그림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바랐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일. 그 간절한 기다림을 벌거벗은 사내와 솟대로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신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대지와의 신성한 결합이자, 우주적 생명력에 동참하는 숭고한 의례였지요.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해 왔으며,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서막을 여는 가이아는 카오스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존재이자 대지의 신이었습니다. 가이아는 하늘과 바다, 산과 인간을 낳은 만물의 자궁이며, 모든 생명이 태어난 자리였지요. 어머니 신화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닌후르사그와 이집트의 이시스, 북유럽의 요르드가 대지의 여신으로 숭배받았고, 중국에는 황토로 인간을 빚은 여와가 우리에게는 산과 강을 만든 마고할미가 있지요. 이렇듯 대지는 여성이었기에 땅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가이아의 생명력이 인간의 농경생활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데메테르입니다. 곡식의 어머니이자 농경의 질서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녀의 기분에 따라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이 닥치기도 했지요. 딸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 세계로 끌려갔을 때,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대지는 싹을 틔우고 풍요를 회복했지요. 이 이야기는 농경 사회에서 수확이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신들의 영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열심히 일 한 뒤 기도로 응답을 기다릴 수 밖에요.
벌가벗은 몸으로 밭을 가는 나경은 조선 중기의 학자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도 나오는 풍습으로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어머니인 대지의 살결에 온몸을 밀착시키며 풍요를 비는 절실한 몸짓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농경문청동기 속 남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대지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기도자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벗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의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지요. 노동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바라면서 신에게 기대기도 하고 무언가를 찾아 의지하기도 하지요. 방식은 달라졌을지라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향한 염원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땅 아래에 여전히 가이아의 생명력과 데메테르의 축복이 맥박치고 있다고 믿는 순간, 대전은 근대 도시를 넘어 신화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소민/배재대 강사, 지역문화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