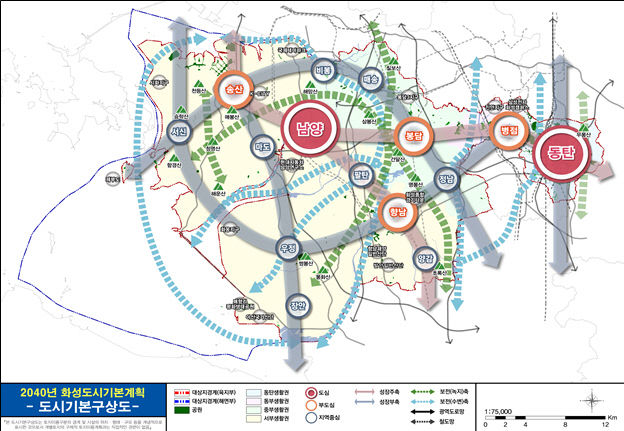지역에서 수행하는 R&D 과제 예산 대부분은 국비나 지방비 매칭에 의존한다. KISTEP 분석으로는 전체 지역 과제 재원의 94%가 국비로 충당된다. 그 나머지마저 대략 지방비 매칭에 의존한다. 순수 지방비가 재원인 지자체 자체 R&D는 극히 일부다. 일단은 재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보다 연구개발 체제가 중앙에 쏠리면 지역의 혁신 역량 증진 의지가 낮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국가 연구개발이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되는 구조에는 장점이 많다. 다만 부처별 지역 사업 간 중복과 연계 미흡 등 단점도 만만찮다. 광학한림원 같은 기관은 벤처캐피털 모델로 관리 체제를 전환하자는 권고까지 내놓는다. 정부 주도 R&D 결과물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저평가된 측면은 있다. 어쨌든 지자체가 주도하면 과업 중심이나 성과 지향으로 가는 데 용이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주권 확보 등 강력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분야는 물론 예외다.
지자체 단위의 새로운 전략도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시·군 주도 R&D 발굴 지원에 나섰다. 산업특성, 비교우위 자원에 착안했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다. 중앙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지방에 분산하면 유사한 효과가 가능하다. 광주·부산·경기 등은 인공지능(AI)산업 키우기에 손을 맞잡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스마트팜 공동사업단을 출범시킨 일은 좋은 선례다. 같은 이치로 쪼개진 연구개발의 단일화 관점에서 지방정부 분산을 시도해봄 직하다.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민·관 역할이 재정립되고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소(小)생태계 조성에 한결 유리할 것이다. 최소한 그 범위는 넓힐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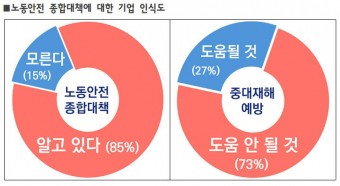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과기대 여자 배드민턴부, `전국 여자 배드민턴부의 새로운 강자로`](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26d/2025112601002240600096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