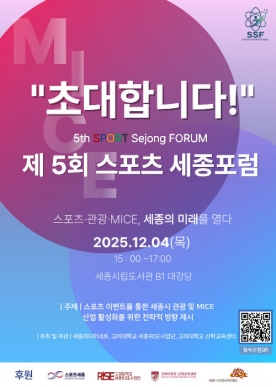|
|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 선임연구원 |
이러한 공간에 대한 감각은 주거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더 오래 가기를 바라면서도 점점 얇고 가벼워지기를 기대한다. 전기차는 좁은 공간에 배터리 셀을 최대한 많이 넣어 얼마나 멀리 주행할 수 있느냐가 구매의 핵심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밀도'라는 개념과 싸우며 살아간다. 작은 공간에서 최대의 성능과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의 생존 방식이다.
이제 이 감각은 에너지 문제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도시의 삶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필수적인 자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전력을 지방에서 생산하고, 대도시로 송전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공식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신규 송전선 건설은 토지 보상, 주민 민원, 환경 논란 등으로 10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제는 대도시도 전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 안에 전력 생산시설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도시의 공간은 제한적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에너지 밀도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밀도 발전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밀도란, 단위 질량, 부피, 또는 면적당 저장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는 약 45메가줄(MJ)/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반면, 우라늄-235는 핵분열을 통해 약 80,000,000MJ/kg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이는 휘발유 대비 약 180만 배의 차이다. 태양광은 어떨까? 태양광 패널은 보통 제곱미터당 150W 정도의 출력을 낸다. 하지만 하루 일조시간, 날씨, 계절에 따라 실제 수요 대응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옥상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꼭대기층 몇 가구의 수요밖에 충당하지 못하며, 별도의 부지를 이용한다면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이는 태양광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저밀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은 밀도의 대명사다. 원자력은 핵분열 반응을 통해 원자의 핵에 응축된 결합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는 원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간 상호작용, 즉 화학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화학반응이 복숭아의 껍질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다면, 핵반응은 복숭아의 단단한 씨를 쪼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원전을 도심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사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그 안전성이 주목받고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작고 유연하게 설계돼 지역 단위 전력 수요에 맞춘 분산형 발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있다. 송전망은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우며, 재생에너지로만 도시를 지탱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고밀도 도시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단지의 형태를 넘어서,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의 삶을 최적화해 온 구조물이었다. 에너지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고 강한 공간, 작고 강한 에너지. 우리가 사랑해 온 삶의 방식은, 미래의 에너지 방식과 맞닿아 있다.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제성분석실 선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2026학년도 수능 채점]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시 전략](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5d/78_2025120401000548600021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