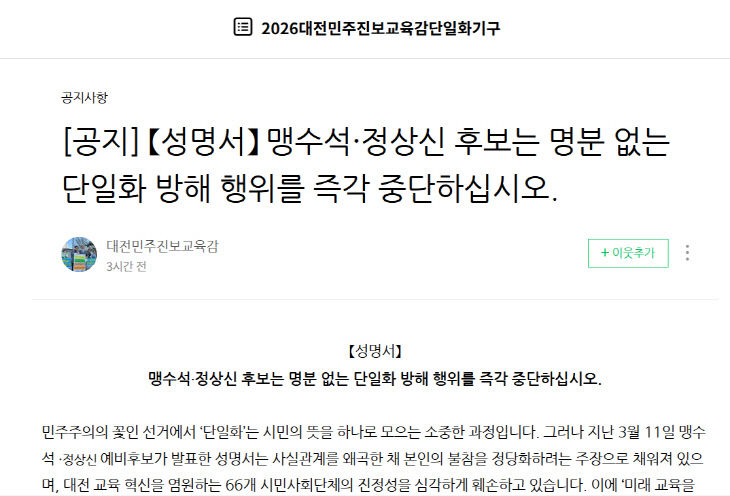|
| 최동연 처장 |
이제 우리는 불씨가 꺼질까를 걱정하진 않는다. 대신 배터리, 네트워크, 계정, 알림 같은 디지털의 불씨로 일상을 유지한다. 길을 잃을까 불안할 때 우리는 지도 앱을 켜고, 약속에 늦을까 초조할 때 실시간 교통을 확인한다. 단체방 알림 하나에 사람들이 모이고, 온라인 대기열 하나에 수만 명이 같은 '문 앞'에 줄을 선다. 횡단보도의 디지털 신호는 낯선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멈춰 세웠다가, 정해진 순간 한 방향으로 흘려보낸다. 예전 모닥불이 밤을 버티게 했듯, 오늘의 디지털은 생활을 버티게 해준다. 불이 맡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지금은 디지털이 조용히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디지털이 편해질수록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기 쉽다. 길 찾기는 쉬워졌는데 방향 감각은 약해지고, 정보는 손쉽게 얻는데 스스로 정리하는 힘은 줄어든다. 영화 속 인물들이 불씨를 다시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듯, 우리도 디지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끝은 아니다.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쓰느냐'다. 더 중요한 건 '쓰느냐'가 아니라 '다룰 줄 아느냐'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학습근육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습근육은 지식의 소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차리는 힘, 질문을 세우는 힘, 근거를 확인하는 힘, 내 말로 짧게 정리하는 힘,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힘을 뜻한다. 근육이 그렇듯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자주 쓰면 단단해진다. 디지털이 생활의 중심이 된 시대에는 특히 이 근육이 쉽게 약해진다. 편리함이 늘수록 생각과 고민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교육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배움의 무대가 교실에서 화면으로 옮겨오면서, 디지털화된 교육의 대표 모델로 사이버학습이 자리 잡았다. 여기서 사이버학습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목표와 활동, 피드백과 평가가 디지털 모닥불에 맞게 돌아가도록 다시 설계되는 방식에 가깝다. 그래서 사이버학습을 콘텐츠를 받아보는 통로로만 여긴다면 학습은 단순 소비로 끝나기 쉽다. 반대로 사이버학습을 훈련장으로 쓴다면 디지털은 내 생각을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학습의 장점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강의를 켜기 전에 오늘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질문 하나로 적어보면, 화면이 나를 끌고 가는 대신 내가 화면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남의 문장을 복사하지 말고 내 말로 다섯 줄만 요약해보자. 그 다섯 줄이 막히는 지점이 내가 아직 모르는 지점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이번 주에 해볼 행동 하나로 바꾸어보자. 짧은 기록까지 남기면 다음 학습은 훨씬 깊어진다. 이런 작은 반복이 학습근육을 단단하게 해준다.
영화 속 불은 꺼지면 끝나는 운명이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불을 만드는 법'을 배우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디지털 모닥불 앞에서 따뜻함만 얻는 사람으로 남을지, 아니면 배우는 힘을 키워 디지털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될지. 디지털 모닥불이 아무리 환해도, 내 안의 학습근육이 꺼지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최동연 건양사이버대 교육혁신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