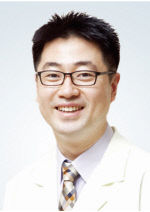시민 입장에서는 속도만 강조되고 구체적인 설계나 의견 수렴이 빈약한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건 당연하다. 대등한 결합인지 한쪽으로의 흡수인지부터 애매했다. 대전시의 행정·정책 주도권 약화나 광역시로서의 지역 정체성 훼손 우려도 컸다. 법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전제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다. 결국 불투명한 통합 추진 방식이 화를 불렀다. 이유는 다양하나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특별법안 탓이 크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존치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주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맞다. 물론 법적으로는 주민투표만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광주·전남은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광역의회 의견 청취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고도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중이다. 대구·경북 역시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선행을 요구했다. 통합에 확신을 못 주는 내용과 방식, 과정의 정당성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다.
행정통합의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다. 대전시민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대전시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공론화 기간 부족과 숙의 시간 미비를 인정한다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한다는 취지야 나쁘지 않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가 승인해도 공고에서 실행까지의 소요 기간과 지방선거 60일 전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앞을 막는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가 최선의 방안인지 더 숙고해봐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열린 자세로 대전시와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잘못하다가 이번 지방선거를 건너뛰면 통합까지는 4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