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충식 논설실장 |
 |
법 이전에 정부가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면 반발이 따른다. 단순화해서, 지역이 최소한의 공간적 단위로 묶이면 지역성이라 한다. 행정구역 변경은 지역성의 변화와 맞먹는다. 관할구역과 경계는 지자체의 기본요소다. 지방의 자율성이 아무리 상대적인 '나이롱(나일론)' 자율성이라 쳐도 간소화를 빌미로 주민 의사에 반하는 반강제적 조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자체의 자치관할권을 중앙의 논리로 직접 침해하려 한다면 위헌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런 한 자락에서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 카드에 분권을 저해하는 헌법의 옷을 갈아입자는 논리의 숟가락을 얹고 싶어진다. 지방 입장에서는 각종 반대론과 속도조절론에 맞서 선제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비할 때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을 법령의 범위에 집어넣으려는 판이니 헌법에서 단 2개인 지방자치 관련 조항마저 위태롭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헌법 전문에 못박으면 어떨까. 헌법 제1조나 2조쯤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이다'라고 화끈하게 명시하든지.
그리하여 개헌을 저 높은 정치담론의 높이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개헌은 정쟁 대상이 되겠지만 판도라의 박스처럼 위악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옳지 않다. 물론…, 시기상조라며 터부시하고 성역의 울타리를 칠 시기는 지났다. 여야 간, 정당 간 공감하는 기류도 있고 시각차도 있다. “협치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박지원)는 말까지 어쩐지 살갑게 들린다. 쉽지는 않다.
다른 어떤 중대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개헌의 용광로는 복잡다단하다. 공론화 과정, 추진 과정을 혼란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반기문 대망론의 맞춤형인 대통령-실세 총리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까지 거론된다. 여기서 보듯 동상이몽은 필연적이다. 지방자치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와 개헌의 연관성, 불가피성의 보편적 의미가 살도록 지방이 먼저 전략·전술로 대비해야 한다. 문제는 30년 다 된 헌법이라는 데 있지 않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축이나 정치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힘든 게 문제다. 개헌론이 이제 불투명한 '설'이나 시비 판별과 현상 구별이라는 '론'의 단계를 훌쩍 넘어설 당위성이기도 하다. 주저하지 말고 이론과 학설과 가설적 위치에서, 또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찾자. 설익은 듯 보이지만 제10차 개정 헌법의 실행과 착수의 시기, 적어도 공론화의 시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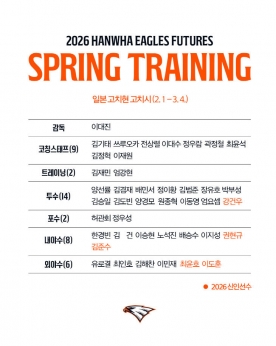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0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