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충식 논설실장 |
때는 6·25 전쟁통이다. 일제 치하 어둠을 뚫고 나온, 광복 이후에 나온 신문들도 발행을 접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공보처에 중도일보를 등록한 것은 UN군의 인천상륙작전 개시 두 달 전인 1950년 7월. 전황은 백척간두였다. 시점상 인민군이 금강을 건너 논산을 점령하고 진주를 함락시키기 직전이다. 1년여 만에 신문이 창간됐다.
당시 타블로이드(2분의 1 크기의 신문) '전시 속보판' 신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경영이었다. 한국광고사 등을 공부해봤더니 동아일보조차 한국전쟁 중 광고 수입은 14%에 불과했다. 구독자 수와 광고 수입 급감은 자료 볼 것도 없이 초라하다. 당연지사다.
일반의 상식과 달리 한국전쟁을 거치며 신문사가 오히려 많아지긴 했다. 휴전협정 이듬해 정기간행물 숫자는 일간신문 56개, 주간신문 124개였다. 격월간, 계간까지 합치면 411개다. 서울 277, 경기 12, 경남 27, 경북 24, 전남 21, 전북 16, 충남 14, 충북 7, 제주 7개였다. 중도일보는 포함해 이 가운데 현재 명맥을 유지한 신문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물론 중간중간 고비가 닥쳤다. 군사정권의 언론통제로 기획된 1도 1사(一道一社) 정책은 치명적이었다. 중도일보 역시 '자진 폐간' 형식을 띤 강제 언론통폐합의 희생물이 됐다. 한참 뒤, 필자는 정경부에 소속돼 중도일보 복간 작업에 참여한다. 80년대의 그 뒤안길에 소용돌이 문화가 가로지른 한 시절의 중도일보 성가(聲價)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
| ▲ 복간 추진 당시의 중도일보 사옥. '속간 중도일보사' 현수막이 선명하다. 중도일보 DB |
그런 아우라(분위기)가 과한 탓일까. 스스로 지은 중도일보 창간 광고는 무슨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 같았다. 사관(史官)에게는 사관(史觀)보다 삶과 죽음에 관한 사관(死觀) 정립이 먼저라 했던가. 사관도 지사(志士)도 아닌 자의식에 흠뻑 취한 시절이었다. 좋게 봐주면 기자정신이겠지만, 다른 기자들도 대개는 그랬다.
사명감과 자부심, 기개가 그만큼 넘쳐났다. 중도일보 전국판을 준비하며 옛 신문을 뒤적여보니 한국현대사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실감난다. 강경·부강 등 읍면 지역, 여수·목포 등 전국 84개 지국을 완비하기 전후의 몇 달치 기사를 속독으로 훑어본다. 베트남 다낭 전투부터 야당인 신민당과 민중당의 선명성 경쟁 등등. 느낌이 새롭다.
세월이 흘러도 신문은 신문이구나 싶다. 1966년 3월 16일자에 눈길이 멎는다. 140만원어치인 뽕나무 40만 그루를 심었다는 평택발 기사다. 그날, 전학 온 변전소장 딸 김인자네 집으로 첫 초대를 받았다. 일기장에 기록된 나 개인의 역사라 심심풀이로 찾아봤다. 3월 22일, 대구시 버스요금이 8원으로 인상됐다. 1면에 '중도일보를 파월장병에게' 캠페인과 기탁자를 간간이 싣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베트남에도 중도일보가 배달됐다니, 전설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누군가가 전할 때 '기별하다'고 한다. 기별지(奇別紙)라고 불린 조선시대 조보(朝報)에서 유래한 말이다. 칼럼명 '지역프리즘'을 전국지(중앙지)에 맞춰 오늘 바꾸고 전국에 널리 기별하는 심정을 사자성어로 줄이면 '감개무량(感慨無量)'이다. 전 세계에 “I feel so 感慨無量”을 외치고 싶을 정도다. “중도일보 대단하네. It's 感慨無量.” 칭찬을 독자에게 먼저 들어야 하겠지만….
오랜만에 옛 선배 기자님들의 기사를 읽은 독후감은 '희망' 두 글자다. 뜻밖에도 잘 간추린 사료를 보는 듯하다. 신문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확신이 굳어진다. 사실에 충실하고 감동을 주는 신문 만들기에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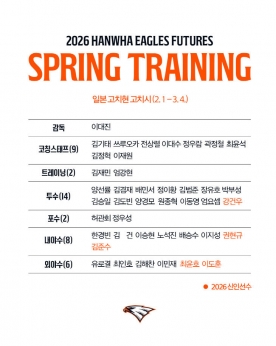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0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