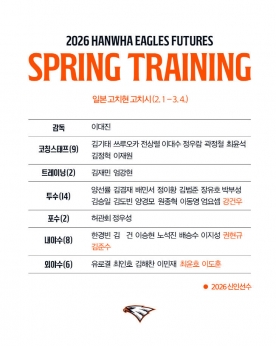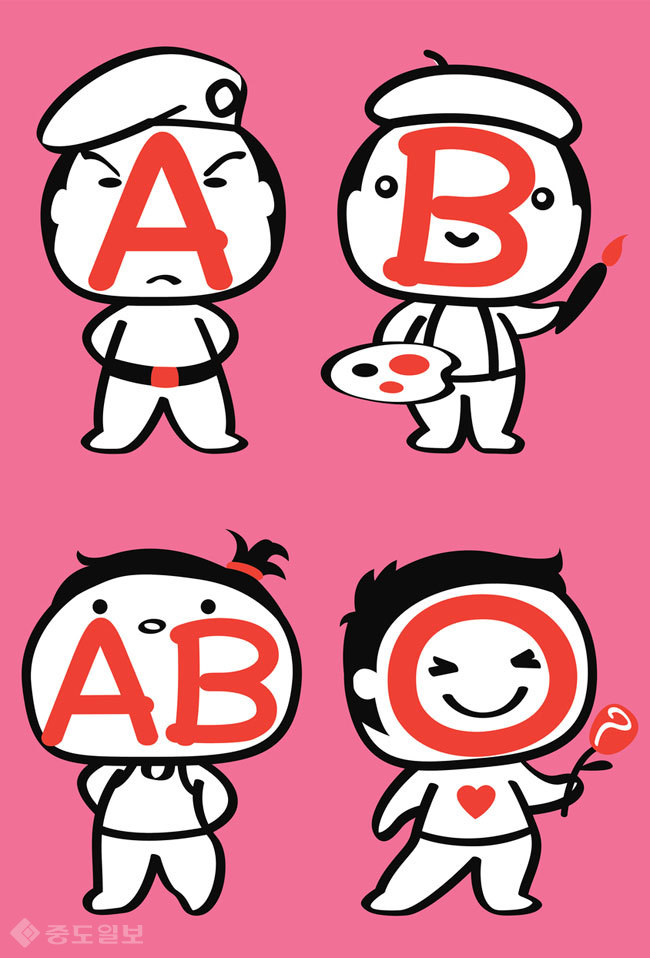 |
|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
‘당신은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는 다소 낯을 가리기도 합니다. 지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기도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네요’
위 문단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신만의 성격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넘 현상’, 혹은 ‘바넘 효과’라고 한다. 19세기 미국의 한 서커스단 단원인 바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마음을 맞히는 것으로 유명했다.
심리학자 버트럼 R. 포러(Bertram R. Forer)는 1948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가 끝난 후 진단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잘 맞는지 0점(대체로 정확하지 않음)부터 5점(아주 정확함)까지 점수를 매기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4점 이상을 주었다. 하지만 포러가 학생들에게 준 답은 “당신은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와 같이 평범하고 뻔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포러 효과’라고도 하며, ‘바넘 효과’가 용어로 굳어진 것은 1950년대 미국의 심라학자 폴 밀이 처음으로 개념을 확립했다.
바넘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와 같은 간단한 심리검사와 혈액형별 성격 등이 있다. ‘A형은 소심하다’, 혹은 ‘B형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사람의 성격은 자라온 환경과 겪어온 경험 등에 의해 결정 되는데 네 가지 혈액형에 보편적인 특징을 끼워맞춰 하나의 성격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혈액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유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