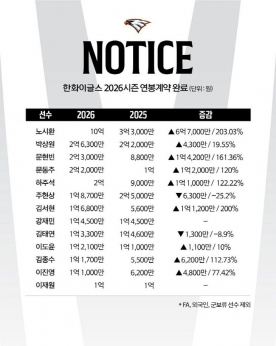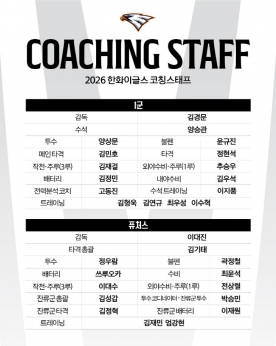|
|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
첫째, 철도 교통망을 통한 도시 형성은 대전의 근대 정체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이,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양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이때부터 대전은 서울·부산, 전라도·충청도 등의 다양한 지역 출신 인구가 몰리면서 '이주민의 도시'로 성장했다. 예컨대, 1920~1930년대 대전역 인근에는 충청도 출신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의 상인과 노동자가 섞여 살며 지역 간 문화가 뒤섞였다. 이로 인해 특정한 고유 지역색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유연한 도시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대전시민들이 특정 지역색보다 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정체성을 갖는 데 기반이 됐다.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인 성심당의 창업주도 이북에서 온 피난민으로 부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주했다.
두 번째 사례는 대덕연구단지의 조성과 과학기술 문화의 내면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들이 밀집한 과학기술 도시의 상징이 됐다. 1992년 11월에 대덕연구단지가 준공했다, 이로 인해 대전은 '대한민국의 브레인 도시'라는 별칭을 얻었고, 현재 대덕연구단지에는 약 8만명의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연구직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술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청사 인근 둔산지구는 각종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이 위치한 '제도화된 삶의 공간'으로, 전통적 공동체 문화보다는 개인 중심의 합리적 생활양식이 강조됐다. 이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향토성과 공동체적 유대보다, 제도와 기능 중심의 도시 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 번째로는 대학과 정부종합청사의 이전으로 학문과 각종 정책을 선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KAIST와 국공립사립대 등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정도시로서 그리고 세종시 연계행정 벨트로서 그 역할과 가치배분의 민감성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입 증가는 대전의 정체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자료를 보면 대전의 외국인 인구는 2만3000명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는 958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1%로 전국 시·도중 2위다.
2000년대 이후 대전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기술 인력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다문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동구, 대덕구 등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문화교육, 통·번역,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전이 단지 행정과 과학의 도시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화인류학적 현상이다.
이처럼 대전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나 행정구역상 중심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철도 교통을 통한 개방성과 이주 경험, 과학기술을 통한 현대적 정체성, 그리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를 통해 유동성과 혼합성, 제도성과 합리성, 다문화적 포용성을 동시에 갖춘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 고정된 지역 정체성보다도 열려 있고 적응 가능한 도시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현대 한국 도시문화의 전환점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관찰지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대전의 정체성인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문화인류학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