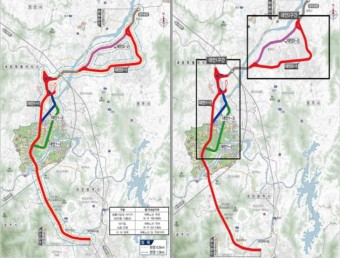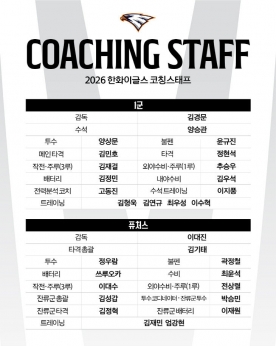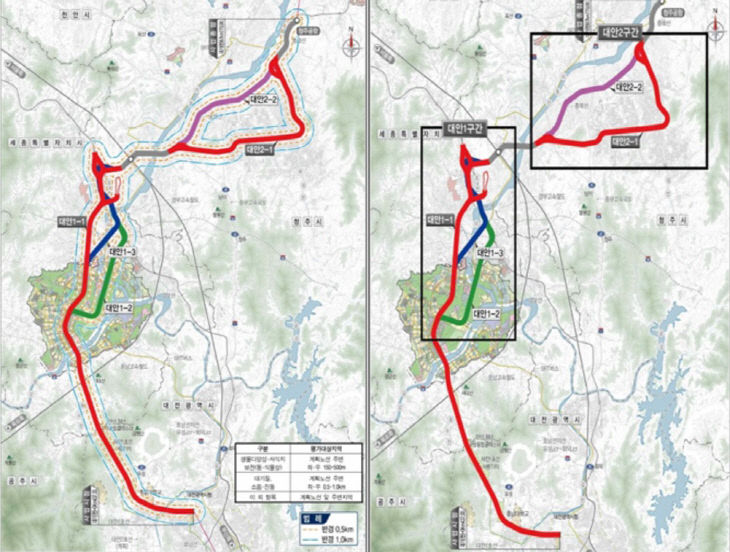|
| 보령 월전초 교사 이용희. |
이국적인 피부색,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듯 긴장한 눈빛, 한눈에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모습도, 행동도 사랑스러웠다. 선생님의 표정과 몸짓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따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과 마주하는 첫날 그렇게 아이들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겼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순간 이기적이었던 내가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졌던지. 중도입국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무장했던 어리석음을 가슴 깊이 반성했다.
한국 학교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황O은 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작년 겨울에 입학해 이미 한국어 교육을 받았던 해O는 연구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교육지원청의 학습코칭을 신청했다.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했다. 엉뚱하게 번역이 되어 까르르 웃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루가 다르게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황O과 해O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한 달 새 쉬운 낱말들을 사용해 학교의 아이들과 소통을 했다. 아이들은 오히려 편견없이 황O과 해O를 받아주었다.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대화를 시도하려는 나보다 낱말만으로도 쉽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아이들이 신기하고 대견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황O에게 학교생활에 대해 물었다. "학교 좋아. 재밌어. 선생님 좋아." 아이는 천천히 또박또박 한국어로 대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황O의 늘어난 한국어 실력에 대한 감동인지, 학교와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던 건지 잘 모르겠다.
한 학기가 지날 즈음엔 한국어로 일상의 소통이 거의 가능해졌다.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던 황O과 해O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개구쟁이 그 자체였다.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 해O보다 한국에 늦게 입국해 한국어 사용이 많이 서툴렀던 황O은 수다쟁이가 되었다.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말문이 트인 세 살배기 아이처럼 "왜?"를 달고 살았다. 업무 처리로 컴퓨터에 눈을 붙이고 있는 날이면 "선생님, 바빠? 왜 바빠?"를 외쳤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씨익 웃으며 반말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황O은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지금이 매우 행복하고 선생님이 있어서 참 좋다며 출근하는 보람과 기쁨을 만들어주었다.
스키캠프로 스키장에 갔을 때였다. 황O에겐 한국에서의 경험이 모두 신기했겠지만 특히 눈을 보며 흥분했다. 베트남에는 눈이 없다며 바닥의 눈에 다짜고짜 손을 대었다. "으아, 차가워!" 놀란 토끼눈이 되어 소리를 지르며 눈덩이를 얼른 내 손에 내려놓던 황O의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강습을 시작할 때는 스키를 태워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될 정도로 뒤처지는 듯 보였으나 마지막 날에는 혼자서 짧은 경사를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발갛게 언 볼에 함박웃음을 물고는 이제 자기 혼자서 탈 수 있다며 다음에는 꼭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호기로움에 나도 따라 함빡 웃었다.
일 년을 끝마칠 때가 되니 황O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까지, 아이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고생했다는 교직원들의 따뜻한 응원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오히려 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은 나였다. 낯선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물러섬 없이 도전하며 끝내 성취하는 용기와 끈기를 가르쳐 준 황O과 해O에게 고마울 뿐이다. 언젠가 내게 인복이 있다고 말해준 이의 탁월한 혜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교단을 떠나는 순간까지 매순간 귀한 인연에 감사하며 축복같은 인복을 누리고 살아야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