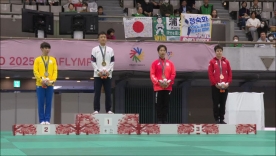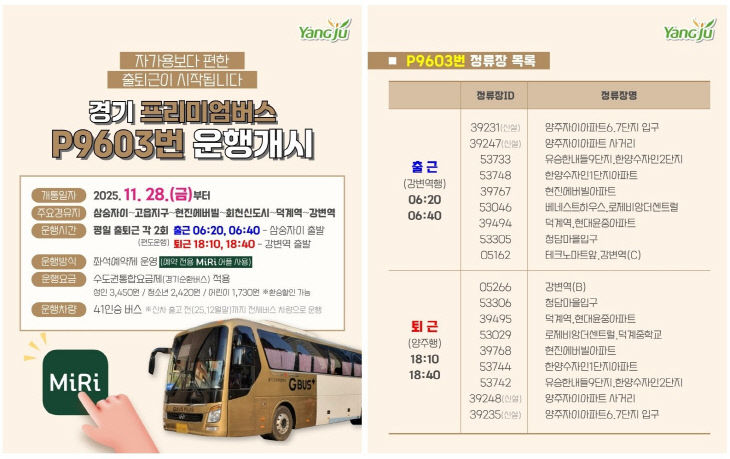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가 구조적이란 점이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에 쏠려 있다. 이 업종들에서 대규모 폐업자가 발생하고 대출 증가세도 주도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보니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빈곤 자영업'이 늘면서 진입과 퇴출만 반복되는 것이다.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인천시나 대전시 등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로 자영업 기반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폐업만이 아니라, 대출에 짓눌려 부실화로 이어지는 속도 또한 심상치 않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올해 2분기 기준 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내용이 좋지 않다. 자영업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자영업 시장의 침체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 때문만이 아니란 사실이다.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패턴의 전환, 디지털 확산과 겹친 점에 착안해 대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새출발기금 확대, 배달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소비쿠폰 지원 같은 단기 지원책으로 위기 돌파가 도저히 힘든 지경이다. 그러니 늘어나는 것은 대출 규모뿐이다.
자영업자의 부채와 연체율로 볼 때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를 보면 단기 금융 지원에서 구조적 전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해야 할 듯하다. 성공 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간 점점 깊어지는 양극화를 무시하고 정책 자원을 일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이 여전히 20%에 근접하는 현실에서는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때가 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