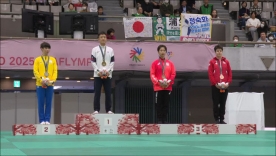|
| 원구환 한남대 기획조정처장 |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중독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름하여 '캐파민(Capamin)' 문화다. 캐릭터(character)와 도파민(Dopamine)의 합성어로, 귀여운 캐릭터에 의해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을 의미한다. 요즘 사람들은 감정노동의 시대를 캐릭터로 버틴다. 사무실 데스크엔 '라이언'과 '춘식이'가 스트레스를 포장한다. 메신저엔 귀여운 고양이나 토끼가 자리 잡는다. 현실은 야근인데, 톡방 이모티콘은 늘 웃고 있다. "힘들다" 대신에 "오늘은 다람쥐처럼 굴러간다"는 식이다. SNS는 더 활발하다. 감정의 원색 대신 캐릭터의 파스텔톤이 넘친다. 감정의 대리인이 등장한 것이다. SNS의 마스코트는 하나의 심리적 피난처가 됐다. 인간 대신 캐릭터가 말하고, 감정을 대신 느낀다. 웃을 힘이 없으니 웃는 캐릭터에게 도파민을 위탁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AI 캐릭터 친구까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듯한 말을 건네고, 나 대신 웃어준다. "오늘 수고했어"라는 한 마디에 우리는 진짜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느낀다. 가상의 존재가 현실의 외로움을 덮는 시대다. 실존의 외로움을 가상 존재의 귀여움으로 달래는 풍경이다.
브랜드도 이러한 캐파민의 전략을 놓치지 않는다. 패션 브랜드는 상품보다 캐릭터 콜라보를, 식품기업은 맛보다 패키지의 귀여움을 판다. 편의점 음료 하나에도 도파민 포인트가 숨어 있다. 뚜껑을 열면 토끼가 웃고, 스티커엔 "오늘도 예쁘다"가 적혀 있다. 맛은 기억나지 않아도 캐릭터는 남는다. 기업은 젊은 세대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복고풍인 '뉴트로(new+retro)' 전략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한 펀(fun) 마케팅을 추구한다.
캐파민 문화의 핵심은 감정의 즉시성이다. 복잡한 감정은 귀여움으로 단순화되고, 공감은 '좋아요'로 대체된다. 감정의 깊이보다 반응의 속도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표정을 빌려 세상과 소통한다. 물론 캐릭터가 나쁜 건 아니다. 캐릭터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감정 소모의 시대를 버티게 하는 방석과도 같다. 문제는 그 방석이 너무 폭신해서 현실의 불편함을 느낄 감각조차 무디게 하는 데 있다. '귀여움'은 마취제이고, '도파민'은 순간적인 약효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자문해 봐야 한다. 우리를 웃게 하는 건 캐릭터의 미소인가, 아니면 그 뒤의 진짜 나 자신인가. 도파민의 파도 위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그 파도가 꺼졌을 때도 스스로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확행'이 진정성을, '욜로'가 자유를, '숏츠'가 자극을 상징했다면, '캐파민'은 위로의 대리 시대를 상징한다. 사람의 대리가 아닌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대면하는 문화가 간절해진다. 캐릭터 대신 진짜 나의 얼굴로, 도파민 대신 인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시대 말이다.
캐파민 문화는 단순히 귀여운 걸 좋아하는 트랜드가 아니다. 그건 현대인의 피로, 외로움, 감정의 피난처가 캐릭터라는 매개로 번역된 현상이다. 우리는 오늘도 톡방 속 고양이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이렇게 속삭인다. "내 도파민, 잘 지내고 있니?" /원구환 한남대 기획조정처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2025 꿀잼대전 힐링캠프] 대전 상소동 오토캠핑장과 산림욕장 눈길 사로잡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24d/78_20251124010019803000852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