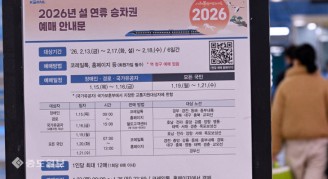이번 발사로 항우연 등 연구기관과 다수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전은 항공우주의 본산임이 거듭 입증됐다. 우주로 보내진 큐브위성 중 항우연의 우주검증 플랫폼 1호는 메모리 반도체 등을 싣고 우주용 부품 성능을 검증한다. 대전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에트리샛도 해양 기상정보 예측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일이지만 대전이 배제된 우주항공청 입지가 또 한 번 아쉬움으로 떠오른 이유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도 대전의 역할이 빠져서는 안 된다.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이 포진한 대전은 분산된 우주정책을 연계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항우연이나 천문연 등을 우주청 소재지로 옮기자는 정치공학적 발상은 배격해야 마땅하다. 미래 우주산업의 윤곽을 더 선명하게 한 누리호 뒤에 '대전'이 있음을 기억할 일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너지 없이 우주기술 기반의 연관산업 발전에 나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모순적인 처사다.
민간 우주시대 서막을 열기까지의 기술 발전에는 1989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항우연의 전신)가 모태가 된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 맞춰 최초의 한국형 과학관측로켓 1호가 발사된 과정도 지켜봤다. 민간 제작 발사체가 부각되지만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발사하는 과정은 항우연 몫이었다. 뒤처진 걸 따라잡는 '캐치업 모드'를 뛰어넘고 기술혁신을 이룰 곳도 대전이다. 내년 누리호 5차 발사체에 탑재할 초소형 위성 '대전샛'도 대전시와 지역 유망 우주기업들이 개발에 한창이다. 한국 우주개발의 중심지인 대전에 집적된 우주산업 관련 자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 동구 소프트테니스팀, 전국 최대 강팀으로 `우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12d/20260107010004431000178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