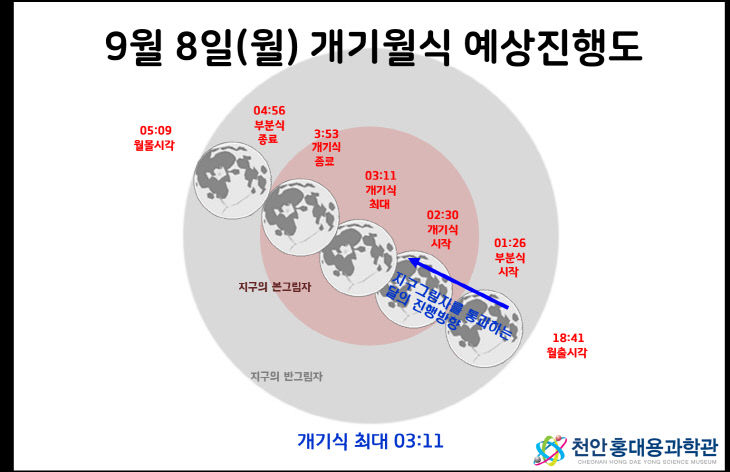|
| 국제재판부를 운영 중인 대전 특허법원. |
대법원이 지난 1월 누리집에 공개한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외국인 당사자 등의 국제적 분쟁을 국내 법원에서 다루자는 취지에서 대전 특허법원에 2018년부터 국제재판부가 운영 중이다. 일반재판부와 달리 국제재판부는 외국어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외국어 서면과 증거 채택 그리고 외국인의 외국어 신문·증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가 최근까지 진행한 재판은 총 2건이다.
보고서는 국제재판부에 사건이 모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외국인이 원고이고 내국인이 피고인 경우가 대표적인 국제사건 유형에서 국제재판 절차의 개시는 양측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해 내국인이 국제재판에 동의할 유인책이 그다지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중요하게 꼽았다. 또 외국인 당사자가 내국인 변호사나 변리사를 대리인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하는데 영어로 이뤄지는 변론은 국제재판부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에서는 증거수집이 제한적이며,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국제재판부가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할 때 창출되는 편익은 5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연간 357건의 사건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편익은 최대 19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으로 특허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했는데,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조사체제인 미국식 디스커버리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과 나아가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를 서울이나 인천 송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여러 차례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등 특허 허브를 어렵게 구축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구성된 국제재판부에서도 현재까지 국제사건 1건이 이뤄져 서울과 송도에 옮겼을 때 국제사건이 늘어난다는 기대도 입증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입장으로 국제재판부의 이전은 검토되는 사안이 아니며, 영상재판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3d/85_20250903001631492_1.jpg)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8d/20250903001631492_1.jpg)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덕구청 남자 세팍타크로팀, `국내 세팍타크로의 새로운 중심으로`](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8d/202509030100029500001021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시즌3] 방송은 프로, 골프장은 아마추어… 박희정 아나운서의 반전 레슨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8d/2025090200170415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