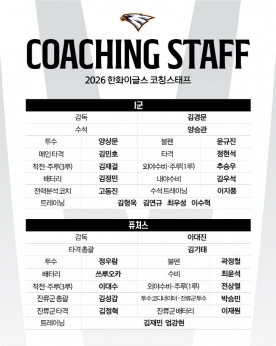|
| 이승선 교수 |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일선의 현장 기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일반 시민들도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다만 언론사나 언론기관, 언론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국적 현실을 들여다볼 때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가하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리되, 징벌이라고 인식될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방식이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배액 배상제라고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3배 이내, 많게는 5배 이내에서 법원이 그 배상액을 정한다. 우리나라에도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 이러한 배액 배상제도가 도입돼 있다. 5년 전쯤 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언론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려는 몇 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언론계가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 당시 언론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언론의 오보 문제를 다루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와 관련한 자율적 규제는 가시적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올해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영리를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조작,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도 법에 따라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형사처벌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데, 피해자로서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영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한 정보를 양산하는 가해자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언론보도나 유튜버의 허위 발언과 관련한 배액 배상제도가 과연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은 통상 손해의 3배 이내로 배상할 것을 규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 평균액은 897만 원이었다. 2022년 인용 액수는 평균 570만 원이었다. 2023년에 평균 배상액이 900여만 원 가깝게 처리된 것은 1억 원이 넘는 판결이 1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탓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이 3배 이내의 배액 배상을 판결하더라도 2000만 원 내외가 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징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독자들 판단에 맡긴다. 독자를 호도하지 않아야 좋은 언론이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