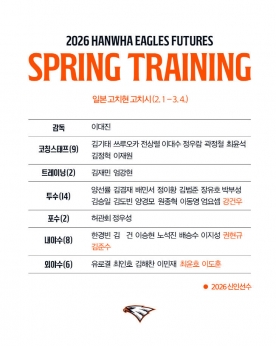|
| 송기한 대전대 교수 |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평화상에서 한 명이 나왔고, 최근 문학상에서 또 한 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일본과 인구 대비로 비춰볼 때, 적어도 10여 명 이상의 수상자가 배출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차이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군사 문화의 유산에서 찾고 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획일주의가 그것이다. 가령 연구진흥재단에서 3년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문화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연구비가 회수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차후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그러니 좀 부실하더라도, 또 연구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성과물은 어거지로라도 제출돼야 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기간 안에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에 걸쳐 지원해주기도 한다. 그러니 사소하고 미미한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세밀한 탐구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가 노벨상을 남의 잔치로 치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질투와 시기의 문화이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이런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1990년대 초 학위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숙을 하고 있었다. 마침 하숙집의 친척들이 일본에서 잠시 휴가차 방문했다. 그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과 아침에 식사를 함께하는데, 이들은 일본어로 대화를 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나 일본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생겨날 정도로 거부감이 있던 시절이다. "당신들,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어로 대화하느냐? 듣기 싫다"라고 일갈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정중히 사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운전기사는 내 짐부터 훑어보고 짐이 많으면 그냥 휙 가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서 트렁크부터 열어줍니다. 이뿐입니까. 일본에서는 어느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잘 나가게 되면 격려해주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용기를 복돋아줍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누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잘 나가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 사람 끌어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찍이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열거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문화"가 조선 민족의 단결을 방해했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그것이 당쟁의 문화를 낳고 궁극에는 조선이 정체되는 본질이 됐다고 했다.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적층되어 왔기에 그것은 그 사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다. 역사성과 현재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시기와 질투의 문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왔을 때, 아니 나오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와 방해 공작이 있었나. 문학상은 또 어떠한가. 작품 속에 반영된 주제를 두고 역사관이 잘못되었느니 무슨 무슨 파니 하며 본질을 떠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는가.
칭찬은 상대방의 업적이나 행동에 대한 존중이고 궁극에는 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은 뒤에서 헐뜯는 사람보다 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다. 칭찬이 많은 사회는 전진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회는 후퇴한다. /송기한 대전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