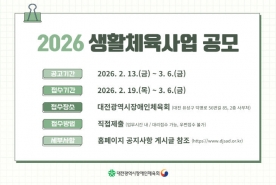|
| 지리산산청곶감축제 홍보 리플릿<제공=산청군> |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내려온 빛이 곶감 표면에 닿는 순간, 주황빛은 유리알처럼 반짝인다.
멀리서 보면 줄지어 매달린 곶감은 풍경이다.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먼저 말을 건다.
차갑고 맑은 공기 사이로 퍼지는 단 향은 겨울이 주는 가장 느린 유혹이다.
손으로 집어 들면 표면은 말랐고 속은 말랑하다.
이빨이 닿는 순간, 쫄깃한 결이 천천히 풀리며 단맛이 번진다.
급하지 않다.
산청 곶감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지리산 자락의 밤공기는 차갑다.
낮과 밤의 온도차는 크고, 공기는 건조하다.
곶감은 이 환경에서 얼고 녹고 마르기를 반복한다.
그 과정이 쫀득함을 만들고, 색을 만들고, 산청 곶감만의 맛을 완성한다.
이 곶감의 시간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 '지리산산청곶감축제'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시천면은 곶감의 마을이 된다.
축제의 시작은 조용하다.
641년을 버텨온 고종시나무 앞에서 제례가 먼저 열린다.
산청 곶감의 뿌리를 향한 인사다.
오후가 되면 마을은 소리를 얻는다.
떡메를 내리치는 둔탁한 박자, 김이 오르는 곶감떡 냄새,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운다.
무료 즉석사진관에서는 가족들이 겨울을 남기고, 목공예와 비즈공예 체험장에서는 아이들 손이 바빠진다.
무대 위에서는 노래가 흐른다.
개막식에는 미스김이 오른다.
가수 김용빈, 안성훈이 열기를 이어간다.
곶감농가 노래자랑과 주부가요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장은 시장과 공연장 경계를 흐린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곶감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전시된 고종시 곶감은 간식이 아니라 작품에 가깝다.
요리경진대회에서는 곶감이 식재료로 변신한다.
달콤함은 디저트에 머물지 않는다.
산청 곶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었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려졌고, 현대에는 귀빈의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몰라도 괜찮다.
산청에서 곶감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설명은 필요 없어진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치고, 곶감이 익는 풍경.
축제장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느리다.
그 느림이 산청 곶감의 맛과 닮아 있다.
올겨울, 지리산 자락에서 곶감 한 점을 씹는 일은 여행이 아니라 체험에 가깝다.
주황빛 겨울이 입안에서 천천히 완성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아울렛, 봄 맞이 마케팅으로 분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6d/78_2026022601001958300084671.jpg)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6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