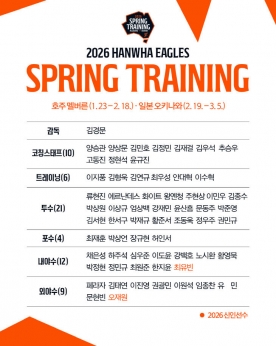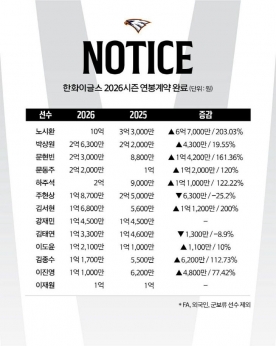|
| 전종희 기자(충북 제천 주재) |
듣기에는 솔깃한 처방이다. 시민 부담을 덜고, 발길을 끌어 상권을 살리겠다는 논리도 그럴듯하다. 그러나 제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이 간단한 공식이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상인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이미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자 편의보다 장기 점유가 먼저다. 아침부터 채워진 차량들은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정작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린다. 무료가 아니라 '무 관리'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주차가 불편해진 구도심 대신, 주차 여건이 좋은 대형마트로 소비가 이동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무료 주차가 오히려 상권 이탈을 가속화하는 구조다. 공실률 30%를 넘긴 제천 중심 상권의 현실은 이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시의회의 문제 제기 역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카드결제 미도입, 불법 하도급, 주차관리인 처우 문제는 분명 개선돼야 할 지점이다. 다만 운영 정상화의 해법으로 '무료화'가 언급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관리 부실의 책임과 요금 정책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월급제 운영은 1인당 월 37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발생시킨다. 이 구조에서는 위탁 운영이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 입찰은 두 차례나 유찰됐다. 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수십억 원의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 결국 비용은 시민의 몫이 된다.
이 논쟁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중간 해법'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무료냐 유료냐의 이분법 속에서 시간제 무료, 회전율 중심 관리, 상인 인증 할인제 같은 현실적 대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다. 구도심 상권을 떠받치는 기반 시설이다. 그래서 더 정교해야 하고, 더 현장을 닮아야 한다. 정책의 선의만으로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다. 관리와 책임,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지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무료 주차가 해법이라면, 이미 비어가는 점포들에 먼저 답해야 한다. 왜 상권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새해설계] 김동수 유성구의장 “생활의 불편부터 줄이는 책임 의정](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5d/78_2026012501001898000079681.jpg)

![[주말날씨] 충청권 강추위 계속… 때때로 눈비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4d/78_2026012301001844500075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