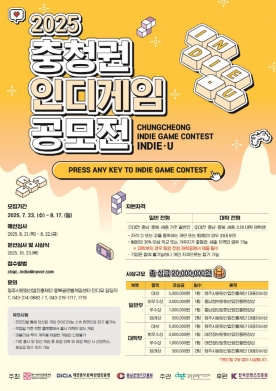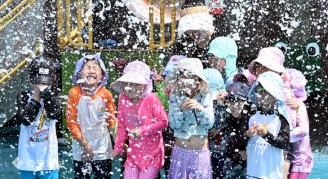우선 이번에도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심신고를 받고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심한 때문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은 모든 축산 농가들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살처분 농가는 보상을 걱정하고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우제류 가축 거래가 금지돼 역시 시름이 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음으로 살처분 매몰에 따른 문제다. 보령의 사례만 봐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를 우려해 살처분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홍성 등 지역 축산농가들은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매립보다는 소각을 원한다고 한다. 이를 포함한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더 강화된 대안, 즉 발생 사후에 소독하고 살처분하는 방식에서 바이러스 유입 경로 차단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몇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구제역이 언제 확산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역 일부 축협 간부들은 해외여행길에 올랐다는 보도다. 느슨한 대처 자세도 구제역을 키우는 요인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구제역 불똥은 식탁으로 튄다는 점이다. 구제역 학습효과와 연말 특수로 소비자들의 충격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 확산되면 안정성 홍보만으론 불안감을 막을 수 없다. 열악한 장비도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 장비 부족으로 농기계를 방역장비로 대체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제역 상시발생국으로 지목돼 청정국 지위가 박탈되면 축산물의 수출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라는 사실만으로도 살처분과 방역 사이를 오가는 방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준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홍성군 등 우리 지역이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둔산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27d/117_2025072701002103100091791.jpg)



![[대전 둔산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100년 미래도시를 위해 "모두 힘 합쳐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27d/78_202507270100210310009179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7m/08d/85_2025070800174651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