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충식 논설실장 |
그리고 노무현판 신행정수도 공약 이래 네 번째 선거, 해당화 선거도 찔레꽃 선거도 아닌 장미대선을 치른다. 15년 세월이 흘렀다. 허허벌판의 황량함과 부작용을 키우는 수도권의 눈칫밥 먹으며 세종시는 인구 25만의 도시로 키워졌다. 기억나는 사람 중 누구보다 잊히지 않는 사람이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 점은 지금도 고맙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행정수도'에선 많이 다르다. 노출 빈도 대비 실행 로드맵이 약하다. 조기 대선으로 선거 전선의 종심(縱深)이 짧은 탓일 것이다. 궁금한 세종시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물으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등은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명분에선 약하다. 애초에 제시된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보다 큰 것은 없다. 첨예한 쟁점도, 격렬한 반대도 없다. 14~15년 전의 해괴한 논법도 보이지 않는다.
 |
| ▲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
그때는 계룡산 천도 불가론 등 참 가관이었다. 장기·연기지역은 600년 전 수도 입지로 퇴짜 맞았다며 하륜(河崙)을 역사에서 불러냈다. 지역이 겹치는 백제의 웅진(공주)·사비(부여) 천도는 호재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 신라 신문왕의 달구벌(대구) 천도 계획처럼 백제의 사비 천도는 정치적 측면도 있다. 군사적·대외적인 요소에 국가 역량 강화의 차원이 있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나타난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론에 궁예의 철원 천도, 실패한 묘청의 난까지 뒤섞여 불가론은 극에 달했다.
더 허접한 것이 있다. 계룡산이 서북방에서 내려오고 물이 동남방으로 흐르는 것까지 반대 논리로 마구 퍼다 썼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실현 가능성을 의심했고 의심은 증폭됐다. 그나마 다행히 헌재는 이전이 안 되는 행정부처를 제외한 이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처럼 산고 끝에 탄생한 세종시다. 12부4처2청 이전 후속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은 거뜬히 이겨냈다. 어느덧 행복도시 건설 10주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지만 계륵이니 갈라파고스니 하며 틈틈이 세종시에 잽을 날리는 행태는 그대로다.
수도 이전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사고가 못박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집단심리가 투영된 '서울아 서울아 600년 서울아'라는 수도권 맞불집회 플래카드가 아직 머릿속에 선명하다. 믿음과 욕망과 상상력은 한 뿌리의 가지들이다. 천도, 즉 수도를 이전하면 국가 정체성과 역사 정통성이 흠집난다는 믿음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 자란 땅에 대한 지역 의존(local dependence)을 갖거나 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다. 행정수도에는 정책 자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충청권 대립의 씨앗이 있어 차기 '대통령'에게 되물은 것이다. 또 위헌 소지를 피하려면 개헌은 피할 수 없다.
역사상 천도가 강력한 왕권 확립을 전제로 했듯이 이것은 추동할 강력한 리더십을 요하는 대업이다. 국운은 비록 다했지만 사비 천도도 알고 보면 대내적 환경이 안정된 시기에 이뤄졌다. 삼천궁녀하고만 연결 지어 풀면 늘 삐딱한 답이 나온다. 15년 넘게 지켜본 입장에서 세종시는 미완의 결말을 과감히 유보해둔 연속극 같다. 또다시 '기승전-세종시'가 되고 말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가 '기승전-서울'이라는, 역사와 지리의 관성 깨기인 걸 어쩌겠는가.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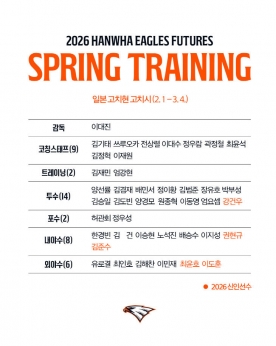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0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