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이 왜 올라감의 대상인가. 지방은 또 왜 내려감인가. 지방에 도착해서는 대구 내려왔다, 부산 내려왔다 식으로 말한다. 지도에 가로로 선을 죽 그으면 위도상 위쪽인 의정부나 비무장지대에서도 서울은 올라간다. 함흥과 신의주에서도 서울은 올라가는 곳이었다. 열차 시각표도 서울 쪽을 향하면 상행이고 서울에서 나가면 하행이다. 지방은 내려가는 하향, 돌아가는 귀향, 떨어지는 낙향만 있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미세하지 않다.
1960년대 경제개발 바람이 일면서는 유행어가 ‘무작정 상경’이었다. 영남은 웬만큼 공장이 들어서 인구를 흡수했지만 충청인, 호남인들은 서울로 밥벌이를 떠났다. 지방은 늙은 부모님이 지켰다. 이것이 수도권 인구 집중의 실상이다. 그 이전에 ‘강남’은 전깃불도 없고 논밭과 과수원 일색이었다.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출간 무렵의 서울 인구는 360만명이었다. 지금 대전시(151만)와 충남도(208만)를 합친 인구 정도다. 그 뒤로 공고한 서울공화국이 되면서 ‘위(上)’라는 위계는 관용어 이상이 됐다.
 |
| ▲ 최충식 논설실장 |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면 여기서 허점이 보인다. 뚜껑을 여니 절반 이상은 충청권 내부 유입이다. 대전시는 인구 150만명선 붕괴를 걱정하고 2020년 인구 100만 시대를 열려는 청주시에는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 홀로 충청권 강남으로 흥할까봐 공주시 등 인접지역은 전전긍긍이다. 충청권 공생과 말의 민주화, 분권화라는 두 숙제를 받아들었다. ‘상경’을 네이버 사전은 ‘지방에서 서울로 감’, 다음 사전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으로 풀이한다. 종이 사전은 정말 가관이다. ‘올라옴’도 부족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옴’이라고 가치 판단의 옷을 껴입히기도 한다.
아무렇지 않다가 별일처럼 여겨지는 것도 관심이다. ‘올라온다’는 편찬자가 서울에서 내려다보며 사전을 만든다는 말씀이다. 감수자도 서울에 있었다. 행정안전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이 먼저 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말을 내려놓자.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는 서울에 안 올라가도 되는 세상에서 성립된다. 중도일보 창간 66주년(9월 1일) 기념으로 욕심이 허용된다면 ‘중도(中都)’를 세종시 별칭으로 쓰자고 제안하고 싶다.
세종시=행정도시(수도) 라벨링(Labelling) 효과 하나는 확실히 챙길 것 같다. 특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행동이 나타난다. 도시도 그렇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한성부(漢城府), 한양(漢陽), 수선(首善), 경부(京府), 경성(京城)과 함께 경도(京都)라고 썼다. 이래봬도 ‘중도’는 한때 검토 대상 도시명이었다. 그렇게 부른다고 서울처럼 세종에 올라가거나 중도에 올라올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논설실장
최충식 논설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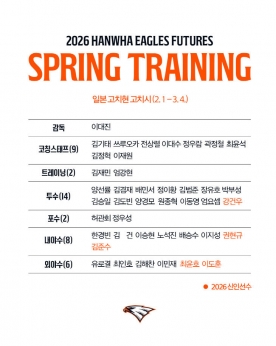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0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