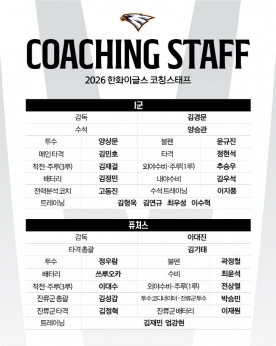|
일찍이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명품은 '필요'보다 '보여주기'의 기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부유함과 고상함,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고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지요. 따라서 명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성취에 대한 보상, 자존심 회복, 사회적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은 수 세기 동안 귀족이나 상류층이 명품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여주기보다는 즐기기와 고급 취향에 비중을 더 둔 것이고, 가문의 전통과 연결하여 높은 브랜드가 문화 속에 녹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절약과 검소가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명품이 성공의 증표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기능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명품에 대한 동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면 서양은 귀족의 문화와 생활 속의 전통이고 동양은 산업화 이후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서양에서는 품격이나 취향 등 전통과 관련이 있지만, 동양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시아 시장에서 명품의 매출이 급증하여 고급 브랜드의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명품의 대표적 브랜드인 루이뷔통, 에르메스, 샤넬은 신제품을 만들 때 아시아에서 먼저 출시하거나 아시아 지역 한정판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품은 사치성 '신제품'뿐만 아니라 공연과 전시에서도 명품 마케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일수록, 또는 티켓 가격이 비쌀수록 매진 속도가 빠르고, 비싼 것이 곧 가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입니다. 똑같은 공연일지라도 뉴욕보다는 서울 공연장에서의 티켓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하였지만,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서울에서 볼 때 25만 원이었는데, 뉴욕에서는 똑같은 공연의 입장료는 70달러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가 명품 브랜드 매출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공연계까지 명품 선호 심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부인의 명품 선호에 대한 실제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심리학 연구에 기반하여 추론한다면, 결국 과시적 소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갤럽 조사(2024년도)에 의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유일성, 과시성, 창의성, 차별성과 같은 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즉 독특하고 차별적인 디자인과 높은 품질, 그리고 사회적 인정까지 이 모든 요소가 명품 소비의 계산된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속된 전 대통령 부인의 명품 선호 심리는 단순한 소비 행위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 표현이나 자기 정체성 구현 등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동기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명품을 감았다고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쉽고 적당히' 산 그동안 '천박한' 삶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는지요.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옥란 기자
현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