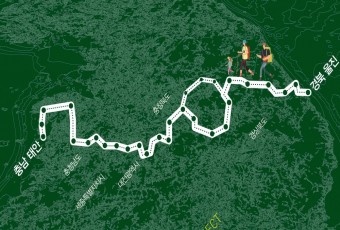|
| 백낙천 교수 |
세종 집권 초기에는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줄이고 사찰을 축소 및 폐쇄하는 등 억불 정책을 펼쳐 나가기도 했지만 1444년에 5남 광평대군이 죽고 1445년에는 7남 평원대군이 두창으로 일찍 죽었으며, 나아가 1446년 4월에는 부인인 소헌왕후마저 잃게 되는 슬픔을 겪자 세종은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명복을 빌고자 궁궐 내 문소전 옆에 불당을 지을 것을 유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1448년(세종 30)에 궁궐에 내불당을 짓겠다고 하자 도승지 이사철 등이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지만, 세종은 선위(禪位)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하게 맞서면서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내불당을 건립하였다. 즉, 1447년에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간행은 반대하지 않았던 신하들이 1년 뒤인 1448년에 내불당 건립에는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은 조선 초기 불교에 대한 이들의 이중적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리영응기』는 내불당 건립과 낙성을 경찬하는 법회에서 일어난 부처의 사리 감응 이적과 불당 건립의 전 과정을 기록한 문헌으로서 당시 법회를 주관한 사람은 신미대사였고, 『사리영응기』는 신미의 동생이자 당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불교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던 김수온이 지었다. 『사리영응기』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판본과 같은 초주 갑인자로서 큰 글씨와 작은 글씨를 병용한 빼어난 서체의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는데, 특히 『사리영응기』가 관심을 끄는 대목은 책의 맨 끝에 기록된 '정근입장인명(精勤入場人名)'이다.
즉, 정성과 근면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내불당 건립과 법회에 참여한 승려 51명, 대군 6명, 문신 9명, 내시 32명 외에 일반 관리 163명 등 총 261명의 직급과 인명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할 것은 궁중 음악을 담당하는 정7품 전율(典律)부터 궁궐 정원 관리 등 잡무를 맡은 종9품 급사(給事)에 이르기까지 하위직 47명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놓은 부분이다. 즉, 『사리영응기』는 백성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 간행한 최초의 문헌이라는 것과 백성들의 한글 고유어 인명을 통해서 한글 사용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리영응기』에 나오는 한글 고유어 인명은 법회에 참석한 악공, 궁궐 정원사들로서 성은 한자로 표기하고 이름은 한글로 표기하여 기존의 이두식 인명 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음절 인명이 29명이고 3음절 인명이 18명이다. 또한, 이들 47명의 평상시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였는데, 가령 '검(도ㅇ), (ㅎㆎㄴ도ㅇ)동, 타내, 거매, 쟈가(도ㅇ), 쟈근대, 모리(ㅿㅚ)' 등은 외모나 신체의 특성을, '곰(ㅿㅚ), 우루미, 가리대, 수새, 눅대, 쇳디' 등은 인물의 성격적 특성에 따른 작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막(도ㅇ)'이란 이름은 5명에 쓰이고 '오마디'라는 이름은 3명에 쓰일 정도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 이름은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선호되는 고유어 이름임을 짐작하게 한다.
『사리영응기』는 현재 동국대와 고려대에 초주 갑인자 인쇄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불과 3년 후인 1449년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간행한 문헌에 최초로 백성들의 한글 이름이 가장 완성도 높은 금속 활자로 평가받는 갑인자 활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세종의 분명한 정음 의식이 애민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리영응기』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훈민정음 반포 579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을 앞두고 조선을 대표하는 금속 활자에 백성들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 『사리영응기』를 통해 성군 세종의 백성을 향한 각별한 마음과 위대한 한글 사랑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백낙천 배재대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