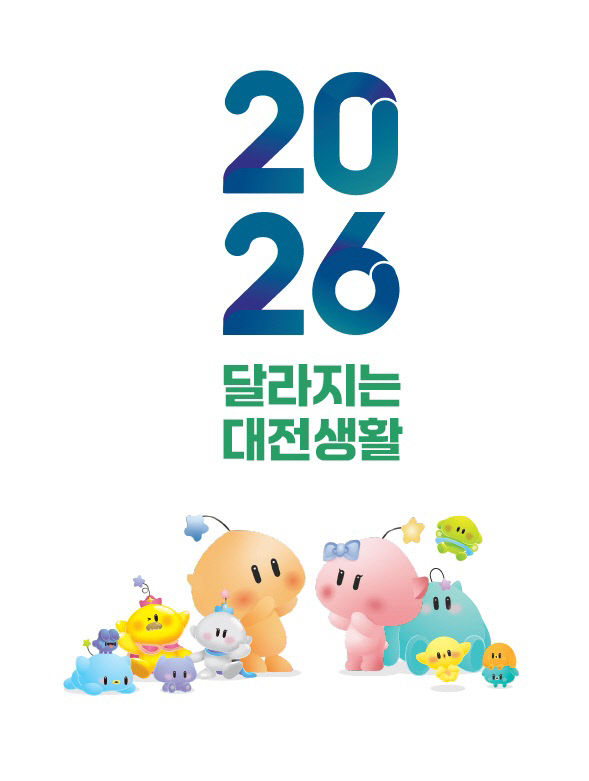우리 자신에 대한 상상력이 변화하기에 이른다. 복잡하고 알기 어렵지만, 소리, 진동, 해부 등 우리 몸을 알기위해 노력 해왔다. 급기야 산체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X-ray, CT, MRI, PET 등 영상기술이 나왔다. 급기야 과학기술로 창조된 사이보그도 대두 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작동원리나 구조는 더욱 심오하다. 아직도 신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속내를 알기위한 노력은 부단히 지속될 것이다.
몸에 아주 미세한 변화만 생겨도 견디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특히 예술가에겐 동작 및 동력, 감각 등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생기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의도적인 불우한 상상은 잘 하지 않는다. 닥쳐서야 극복하기 위한 상상력이 작동한다. 절실함이 드러난다. 상상을 상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상상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지나치게 술을 즐기다 수전증에 걸려, 시달리는 시인도 더러 만난다. 지금은 컴퓨터가 상용화 되어 그나마 자판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보다. 가래떡처럼 꾸역꾸역 시가 나온다. 말하면 문자로 바꿔주는 도구도 있다. 이런 도구가 없던 시절엔 구술하고 자녀에게 대필 시킨 시인도 있다. 의도하지 않은 합작이다. 의도적으로 단어, 행, 연 등을 번갈아 써보면 어떨까?
문자예술로 가면 더욱 난감해진다. 서예가 유희강(劍如 柳熙綱, 1911~1976)은 5체에 두루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각과 그림에도 뛰어났다. 유작을 대하면 웅장하고 막힘이 없음을 느낄 수 있다. 한국서예가 협회장으로 현대서예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1968년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다. 마비를 극복하고 1971년 개인전을 연다. 인간승리의 모범이다.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연구하여 좌수서를 만든 것이다. 진혜련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검여는 장자 잡편에 나오는 법천귀진(法天貴眞)을 지향했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법은 자연을 의미한다.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대로 썼다. 검여의 말이다. "오직 서는 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신념으로 눈으로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보고 가슴으로 쓰는 것이라 생각해서 진도가 느린 학습을 계속하였다."
한 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서예가 황욱(石田 黃旭, 1898~1992)도 수전증에 시달렸다. 석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3년 75세 때라 한다. 가까이에서 그의 놀라운 글씨를 지켜보던 전주지방 유지들이 초대하여 주었다. 회혼기념서예전이었다. 1974년 문예진흥원미술관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후원 서울 작품전을 시작으로 1991년까지 매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한다.
악필서법(握筆書法)으로 유명하다. 주로 행초서 작품이 보인다. 누구도 따라 갈 수 없는 기세와 무기교의 순박함이 돋보인다. 단순하고 독특한 운필과 운율이 가히 독보적이다. 초탈의 경지를 보여준다. 장엄하고 생동감이 넘쳐 거문고 소리로 다가온다.
소싯적에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 필법 중심으로 서예공부를 시작, 꾸준히 정진하였다. 1960년경부터 수전증으로 붓 잡기가 어렵게 된다. 붓대를 손바닥으로 잡고, 엄지로 꼭지를 눌러 운필하는 자신만의 악필법을 개발한다. 87살부터는 오른손 악필마저 곤란하게 되자 왼손악필을 사용한다. 체력도 저하된 90세 이후에 오히려 대표작이라 할 뛰어난 작품들이 탄생한다.
입에 물거나 발가락 사이에 끼워 작품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어려움으로 새로운 세계가 탄생된다. 우아함 이면에 어려움을 극복한 절실함이 숨겨져 있다. 불편부족, 결핍의 절실함이 열정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피 토하는 절실함은 흉내 내기 어렵다. 아픔을 진지하게 공감하면 절실함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양동길/시인, 수필가
 |
| 양동길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